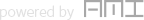|
||
지난해 라디오방송 시작…누적방문자수 60만명
“시간이 없어서…”, “잠자기도 바쁜데….” 블로그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상당수 기자들이 머리를 긁적거리며 하는 말들이다. 그 말들의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한가한(?) 기자들만 블로그를 한다는 선입견이 깔려 있다. 마감에 치이고 취재원들에게 치여서 사는 기자들에겐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자들이 적지 않다. 잠을 줄여가며, 점심을 대충 때우고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 물론 기자생활을 소홀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기자 파워블로거 첫 주인공인 한겨레 허재현 기자도 그 축에 속한다. 2007년 8월 입사한 2년차 신참기자로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현장을 뛰어다닌다.
그는 2007년 10월부터 ‘다시 한번 까딸루냐 찬가’(http://blog.hani.co.kr/catalunia)라는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블로그 이름은 ‘동물농장’ ‘1984’ 등으로 유명한 조지 오웰의 소설 ‘까딸루냐 찬가’에서 따왔다. 대학 때 이 소설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는 그는 소설 내용처럼 세계 민중연대를 꿈꿔보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허 기자가 블로그를 하게 된 것은 기사 이외에 취재 뒷이야기 등을 인터넷에 올리면 한겨레 사이트를 찾는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처음엔 취재 뒷이야기나 수습기자의 일상, 개인적 취미인 영화 이야기 등을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쓰는 게 전부였다.
그런 글쓰기에 변화가 온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그의 블로그가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에 노출되면서 방문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루 2만~3만명의 누리꾼들이 방문한 것도 여러 차례. 그 전까지 10만명 수준이었던 방문자수는 최근 한두 달 새 30만명이 넘었다. 누적방문자 수는 1월13일 현재 59만여명.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서 블로거가 하나의 미디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옛날에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었는데…. 부담이 되는 거 있죠. 글 쓰는 횟수부터 늘렸어요. ‘킬’된 기사를 올리고, 블로그 전용 아이템도 찾으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고민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라디오방송이다. 음악과 시사문제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그의 목소리로 녹음해 내보내는 것으로, 첫 방송은 지난해 12월2일 전파를 탔다. ‘라디오를 켜봐요’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기획, 극본, 연출, 진행까지 1인 4역을 하고 있다.
방송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집에서 방송을 녹음한 뒤 그 파일을 한겨레 서버에 올리면 끝나기 때문. 대학 때 인터넷에서 라디오방송을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지금까지 세 차례 방송됐는데 말 그대로 ‘빅히트’를 치고 있다. ‘새롭고 흥미로운 시도’ ‘방송의 블루오션’이라는 찬사가 누리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겨레 취재영상팀 은지희 PD가 프로그램 연출에 합류했다. 그는 2주에 한번 정도씩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라디오 프로젝트는 3월 개국 예정인 한겨레 웹방송에서 고정코너로 예약된 상태다. “내가 쓴 기사를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아 실험삼아 해봤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신문 기사 외에도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았지요.”
그는 멀티미디어 기사를 생산하는 취재영상팀 소속이다. 경찰서에서 수습생활을 끝낸 뒤 이 팀에 발령받았다. 온라인에서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늘 고민하는 팀 분위기는 그의 블로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가하게 웬 블로그…’라는 불편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뿐더러 블로깅을 장려받을 수 있어서다.
딜레마도 없지 않다. 블로그에 매여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유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집에 가서도 블로그에 뭔가를 써야 한다는 압박감도 적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즐기지 않으면 제대로 된 블로그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블로그를 통해 독자와 호흡하고 소통하는 것이 즐거워야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는 하나를 덧붙인다. 바로 사명감이다. 독자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다.
기자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일반인보다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남들이 가지 못한 곳을 갈 수 있고, 일반인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다. “기자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토대로 기사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정작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썩히기에 아까운 콘텐츠들이 기자들의 노트북에는 무한정 저장돼 있는 셈이죠. 독자를 위해 기자의 노트북을 열어야 합니다.”
- 관련기사
- - “자연의 소중함 전하고 싶습니다” (2009/04/08)
- - “관심·공부·취재가 원동력이죠” (2009/03/18)
- - “생생한 삶의 소리, 아름다운 남도 풍광” (2009/03/11)
- - “첨단기술 IT 술술 풀어드려요” (2009/02/25)
- -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 다 쏟아내야죠” (2009/02/11)
- - 세상을 향해 외치는 두 기자의 함성 (2009/02/04)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