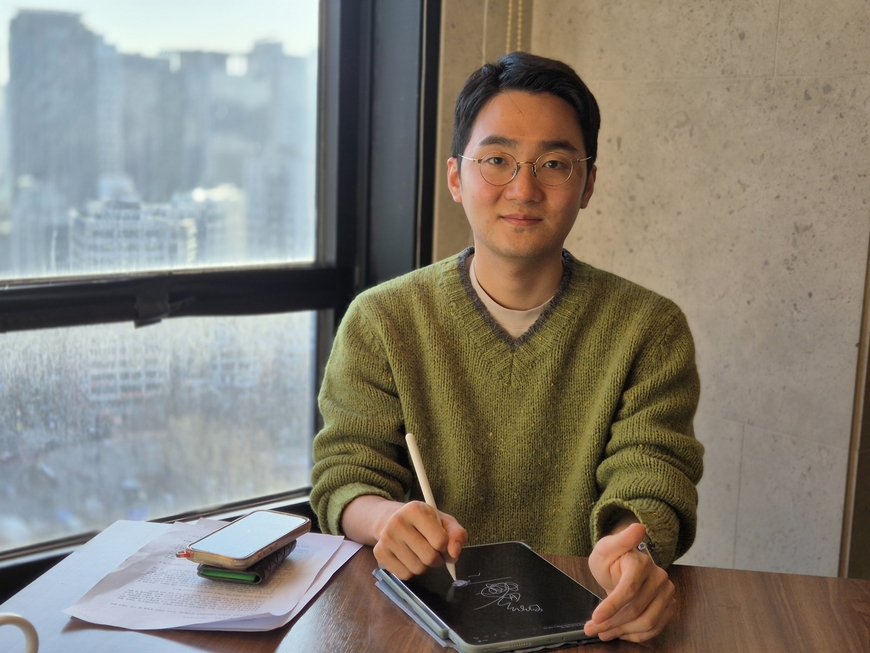
두 달 전만 해도 일간지 기자였는데 그 사이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지난해 12월12일 세계일보, 며칠 뒤 조선일보에서 신춘문예 당선 전화를 받았다. “기분이 좋았는데, 금세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평론가로서 준비가 됐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충분히 읽었는지 이런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세계일보와 조선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서 당선된 오경진 서울신문 기자를 1월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만났다. 그는 “책 소개를 할 때 비평적 시각을 담아 글쓰기를 했다”며 “작품과 대화하는 방법을 문학 기사를 쓰면서 배웠다”고 했다. 2017년 서울신문에 입사한 그는 2023년 말부터 문화체육부에서 문학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다.
신춘문예 당선은 오래전부터 문학에 열정을 품어온 산물이었다. “사실 시를 꽤 오래 전에 배우고 오래 써왔습니다. 신춘문예 문을 두드리기도 했고요. 시 외에도 문학평론에 관심은 있었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글쓰기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싶어 독학했는데 쉽지 않았다. 그러다 문화부에 오면서 문학평론의 길을 전문적으로 걸어보고 싶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무(無)의 정치, 혀의 신학―김혜순론’은 대학원에서 공부한 정치신학이 밑절미가 됐다. 그는 “대학원 지도교수인 조효원 교수님 영향을 받아 김혜순 시인을 공부했다”면서 “칼 슈미트부터 발터 벤야민, 야콥 타우베스에 이르는 테제인 정치신학의 흐름과 대비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인으로 김혜순을 선정하게 됐다. 김혜순의 시는 나에게 대단히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텍스트로 읽혔다”고 했다.
‘김혜순론’은 신춘문예와 문예지 등에 여러 번 투고하면서 대폭 수정한 반면, 김숨의 소설 ‘간단후쿠’를 비평한 세계일보 당선작(쓰이지 못한, 쓰인 적 없는―김숨, ‘간단후쿠’)은 두 달 만에 썼다. “지난해 10월에 나온 신작인데, 11월에 글을 완성했어요. 김숨의 ‘간단후쿠’는 그냥 책이 아니었습니다. 평론에도 썼지만 거대한 고통과 마주하고 있는 책이었어요. 읽은 뒤에 어떤 문장들이 내 안에서 들끓었고, 토해내듯이 썼습니다.”
시인·소설가로 등단한 기자들이 있지만, 문학평론 등단은 흔하지 않다. 문학평론을 왜 하게 됐냐는 물음에 그는 “문학을 향한 욕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면서 “문학 담당 기자가 평론가로 활동한다면 시너지가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물론 그것보다는 문학을 향한 애정이 먼저죠. 단순히 기자로서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쉽게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시인과 소설가를 만나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무언가 더 써내고 싶은 게 내 안에 남았는데, 평론은 그것들의 결정체인 것 같습니다.”

오 기자는 신춘문예 당선 소감에서 ‘김미경·홍지민 선배’를 거론하며 특별하게 고마움을 표했다. 김미경 기자는 2024년, 홍지민 기자는 2025년 문화체육부장을 하면서 그의 기사를 매일 같이 데스킹하고 피드백을 해줬다. 그는 “두 분 모두 제가 어떤 책을 골라서 쓴다고 했을 때 ‘하지 말아라’, ‘그게 되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최근 홍지민 선배랑 자리가 있었는데, 선배가 ‘네 글을 1년 동안 보니까 글쓰기에 습관이 좀 보이더라’고 얘기해주셔서 뜨끔했다.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바꿔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취재하고 기사 쓰기도 빡빡한데 그는 지난 2년간 연세대 대학원 비교문학협동과정에서 공부했다. 각오는 했지만, 읽어야 할 책이나 써내야 할 글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철학이나 비평이론 서적은 텍스트 양이 많았다. 2024년 대학원 첫해엔 어떤 글을 써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런 힘듦을 모르고 이 세계에 뛰어든 것은 아니니 괜찮다”면서 “학부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 공부하니까 눈이 뜨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올해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내년쯤 박사과정 입학을 계획하고 있다.
오 기자는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출신으로 해직된 후 문학과지성사를 창립한 김병익 문학평론가를 본받고 싶다고 했다. “기자가 평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김병익 선생님이 그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나름의 세계에서 고투하고 있을 작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그리고 조명받아 마땅한 작가를 밝은 눈으로 찾아내는 것. 문학을 가지고 동시대를 날카롭게 진단하는 글을 써내는 것. 요즘에 다소 퇴색되고 머쓱한 말이지만, 동시대의 ‘지성인’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