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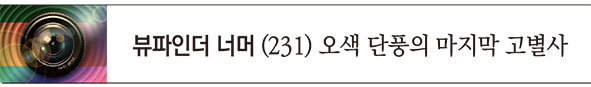
‘뷰파인더 너머’는 사진기자 박윤슬(문화일보), 이솔(한국경제신문), 고운호(조선일보), 박형기(동아일보), 이현덕(영남일보), 김정호(강원도민일보)가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만난 사람과 세상을 담은 에세이 코너입니다.
단풍은 가을이 되면 당연히 찾아온다고 믿어온 계절의 상징이다. 햇빛은 서두르지 않았고, 밤은 조금씩 길어지며 잎에게 색을 준비할 시간을 내주었다. 단풍은 그렇게 완성됐다. 성급하지 않은 시간 위에서 잎은 스스로를 비우며 속에 품은 빛을 꺼냈다. 붉고 노란 색은 자연이 제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였고, 우리는 그것을 가을이라 불렀다.
그러나 지금, 그 풍경은 점점 기억 속 장면에 가까워지고 있다. 여름은 물러설 줄 모르고, 겨울은 가을이 채비를 마치기도 전에 밀려든다. 공기는 충분히 식지 못한 채 계절이 겹치고, 빛은 잎이 고운 색으로 완성될 만큼 오래 머물러주지 않는다. 우리가 알던 단풍은 깊어지기 전에 마르고, 색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사라진다. 늦어진 단풍은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믿어온 계절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 변화는 풍경에만 머물지 않는다. 따뜻한 바람이 길어질수록 가을을 빚어내던 나무들은 더 높고 서늘한 곳으로 물러난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는 사계절의 기억 대신, 변하지 않는 초록만 남을지도 모른다. 단풍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다. 그것은 눈앞의 아름다움이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 자체가 이미 과거형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굳이 수치나 분석을 꺼내 들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색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한 채 떨어지는 잎들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되묻는 고별사라는 것을.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