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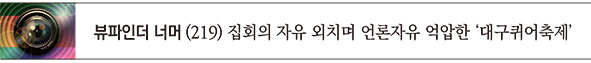
‘뷰파인더 너머’는 사진기자 박윤슬(문화일보), 이솔(한국경제신문), 고운호(조선일보), 박형기(동아일보), 이현덕(영남일보), 김정호(강원도민일보)가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만난 사람과 세상을 담은 에세이 코너입니다.
20일 대구 도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는 대규모 경찰 병력의 호위를 받으며 진행됐다. 도심 한복판의 차량 통행은 통제됐고 하루 종일 대구 최대 번화가 일대는 극심한 교통 혼잡에 시달렸다. 행렬은 수십 개의 깃발과 함께 도로를 가득 메웠다. 조직위는 수십 년간 이어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내세워 집회를 개최했고, 공권력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도로 사용을 보장하며 행렬을 보호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당당히 누렸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 함께 보장되는 또 다른 자유, 언론의 자유는 현장에서 억압당했다.
기자들은 헌법과 집회 시위 현장의 초상권 판례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취재에 나섰다. 그러나 주최 측은 개인정보 제공과 더불어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보도를 강요하는 서약서를 쓰게 하며 등록을 강제했고, 비등록 언론은 접근조차 차단됐다. 신분증 탈취 시도와 촬영 요구,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짙었고, 사진 삭제 강요와 물리적 취재 방해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해프닝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거스르는 심각한 모순이었다.
집회의 자유를 외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법정 다툼에서는 언론을 활용했지만, 현장에서는 언론을 배제했다.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모두 헌법이 동시에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린다. 다양성과 인권을 외친 축제가 스스로 내세운 가치와 배치되는 순간, 그 진정성은 설 자리를 잃는다.
집회가 헌법적 권리로 존중받는 이유는 언론과 사회 전체의 자유를 함께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방침 속에서만 즐기려 한다면, 공공의 광장이 아니라 사설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