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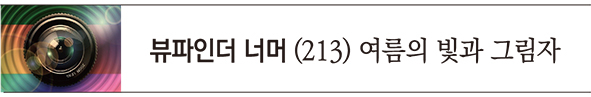
‘뷰파인더 너머’는 사진기자 박윤슬(문화일보), 이솔(한국경제신문), 고운호(조선일보), 박형기(동아일보), 이현덕(영남일보), 김정호(강원도민일보)가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만난 사람과 세상을 담은 에세이 코너입니다.
작열하는 여름의 폭염은 모든 곳을 덮치지만, 피할 수 있는 그림자는 모든 이에게 같지 않다. 도심의 분수대는 쉼 없이 물을 뿜어내고,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누린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여름의 풍경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추억은 아니다.
대도시의 여름은 풍요롭다. 동네 공원의 분수와 물놀이장, 시청이 운영하는 워터파크까지 지역 곳곳에 물이 흐르고, 방학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매일같이 그곳으로 모인다. 물은 단지 더위를 식히는 도구가 아니라, 웃음과 기억을 길어 올리는 일상의 배경이 된다. 놀이가 일과가 되고, 여름은 자연스럽게 축제가 된다.
하지만 도시의 혜택이 닿지 않는 곳, 시골의 여름은 다르다. 마을회관 앞 공터에 며칠간 설치되는 작은 에어 풀장이나, 멀리 떨어진 수영장을 한두 번 다녀오는 것이 그해 여름의 전부일 때도 있다. 운영 기간은 짧고, 참여는 날씨나 이동 수단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어떤 아이는 물속에서 웃고, 어떤 아이는 여름이 지나가길 바라며 그 시간을 견딘다. 같은 하늘 아래, 너무도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폭염은 모두를 덮지만, 그 속을 견디는 방식은 고르지 않다. 사진은 도시의 빛을 비추지만, 그 반대편에 놓인 시골의 현실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 더 많은 여름이 숨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나 숨을 수 있는 더 공평한 그늘이다. 땡볕은 어디에나 닿지만, 그림자는 준비된 자리에서만 생겨난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