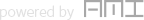오동진 영화평론가가 22일 경기신문에 ‘영화, 야구에 관객을 뺏기다’란 제목의 칼럼을 썼다. 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젊은 층 관객을 뺏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 평론가는 “여성들은 한국의 극장가를 좌지우지했던 핵심 관객들”인데 “그 관객들이 요즘 죄 야구장으로 가고 있다”면서 “극장의 위기는 콘텐츠 퀄리티의 위기도 있지만 기존의 자신들을 지지했던 관객들, 청중들을 잃고 있다는 정치적 위기가 본질”이라고 썼다.
‘극장의 위기’는 눈으로, 데이터로, 경험으로 확인된다. 대한극장같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극장이 지난해 문을 닫았고, 주변 상권 조성에 톡톡히 역할을 했던 멀티플렉스 극장들도 잇따라 폐관 소식을 알렸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월 발표한 ‘202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을 보면 지난해 극장 매출액은 1조1945억 원, 전체 관객 수는 1억2313만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5.3%, 1.6%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 극장 매출액 평균(1조8282억 원), 전체 관객 수 평균(2억2098만 명)과 비교하면, 각각 65.3%, 55.7% 수준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다. 그나마 작년엔 ‘파묘’, ‘범죄도시4’ 등 ‘천만 영화’가 두 편이나 나왔는데도 이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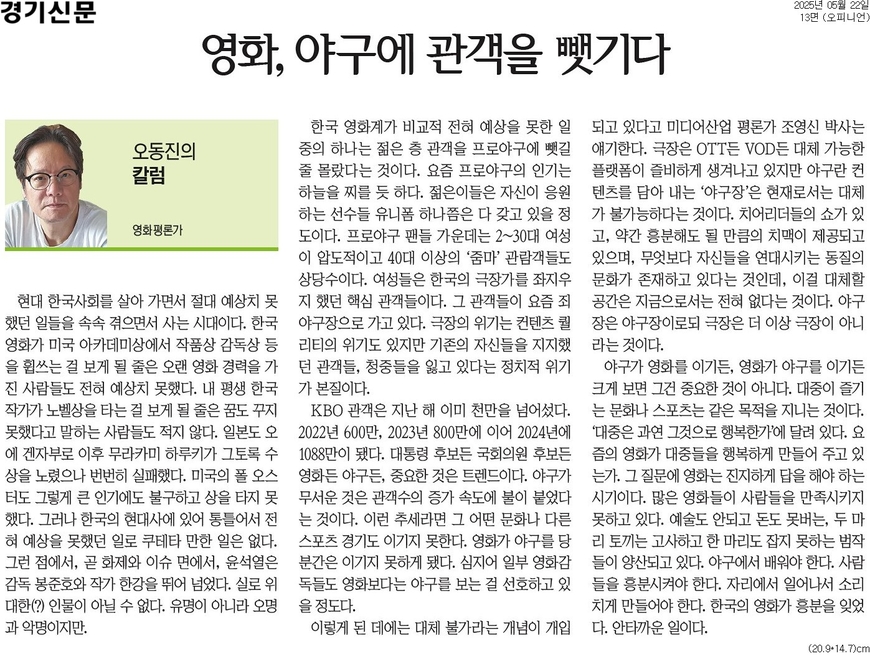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 1~4월 극장 매출액은 2515억원, 관객 수는 2625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 정도나 줄었다. 해당 기간 흥행 1위를 기록한 영화 ‘미키17’이 동원한 관객은 300만명을 겨우 넘겼다.
그런데 오 평론가가 관객을 빼앗겼다고 한 프로야구는 어떤가. 3월 시범경기 역대 최다 평균 관중 기록을 경신하더니 역대 최소 경기 200만, 300만, 400만 관중 달성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첫 ‘천만 관중’ 신화를 쓴 프로야구는 올해 같은 기록 달성 시점까지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젊은 관객들이 극장 대신 야구장을 찾고 있으니, 극장은 관객 대신 야구팬들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이다. CGV는 지난 3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주 일요일 2경기씩 극장에서 생중계하고 있다. 극장에서 야구를 ‘직관’하는 것이다. CGV인천은 아예 야구 특화 상영관으로 정했다. 야구를 보며 즐길 각종 식음료 세트도 출시됐다.
이미 극장은 더 이상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야구장이자 공연장이며, 심지어 평일 낮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어쩌면 머지않아 영화 보러 극장 간다는 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야구에 뺏긴 관객을, 야구를 이용해 불러들이는 극장. 이런 아이러니는 방송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팬데믹 기간 무섭게 성장한 글로벌 OTT에 시청자도, 광고도 뺏기며 위기를 느낀 방송사, 제작사들이 OTT에 콘텐츠를 팔고 또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해 줄을 선다. ‘적과의 동침’ 같은 ‘전략적 협업’이다. 지난 몇 년간 넷플릭스가 올려둔 제작비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이제 사실상 넷플릭스 밖에 없어졌기도 하다.
오동진 평론가는 칼럼 말미에 미디어산업 평론가 조영신 박사의 말을 인용, “극장은 OTT든 VOD든 대체 가능한 플랫폼이 즐비하게 생겨나고 있지만 야구란 콘텐츠를 담아내는 ‘야구장’은 현재로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송을, 언론을 대체하고 있거나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 방송이, 언론이 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경험, 가치는 무엇일까. 근본적이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