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열쇠는 그 나라의 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주시경 선생의 말이다. 주시경 선생은 사회와 민족,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말과 글을 녹슬지 않게 갈고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1911년 ‘말모이’란 이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을 편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의 유지는 최근 일부 언론사에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말 사전 운동을 벌인 조선일보나 방언 관련 콘텐츠를 제작한 부산일보가 그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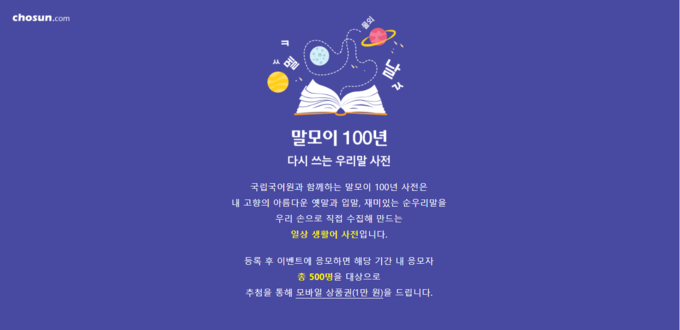
조선일보는 내년 창간 100주년을 맞아 국립국어원, 한글학회 등과 함께 ‘말모이 100년,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 운동을 최근 시작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순우리말, 옛말과 입말, 구수한 방언을 온 국민이 함께 모으는 작업이다. 지난 7일 운동 시작과 함께 열린 말모이 100년 사이트에는 △놀이와 생활 △먹을거리와 맛 △동식물과 자연 등 6개로 분류된 주제에 실시간으로 우리말이 등록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1년 후에 이를 엮어 ‘아름다운 우리말 사전’을 만든다.
말모이 운동 사무국을 맡고 있는 김형주 상명대 국어문화원 교수는 “각 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방학만 되면 여러 지역에 조사를 나가는 식으로 방언을 수집했지만 연구가 굉장히 지엽적으로 이뤄졌고 그 자료나 조사 결과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며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샘’ 사전을 만들어 방언 자료를 구축해놨지만 여전히 미흡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사 주최로 이 같은 운동을 연 것은 뜻 깊다”고 말했다.
열기는 뜨거웠다. 애초 목표는 어휘 4000개를 모으는 것이었지만 이틀 만에 1300여개의 어휘가 모였다. 사이트 입력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자신이 모은 어휘 목록이 많은 사람들은 편지나 파일, 책자를 보내오기도 했다. 김형주 교수는 “적어도 10만개는 모일 것 같다”며 “이 정도라면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작은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더 큰 사업이 되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엔 부산일보가 부울경 방언 콘텐츠를 모아 ‘사투리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었다. 주요 콘텐츠는 이용자의 방언 족보를 찾는 퀴즈다. 이용자가 보기 중 익숙한 사투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15개 문항을 풀면 해당 방언의 사용 지역 통계를 분석해, 부울경 20개 지역 중 응답자 방언과 가장 유사도가 높은 상위 3곳을 지도 위에 보여준다.
콘텐츠를 기획한 박진국 부산일보 기자는 “부산일보가 크리에이티브 팀을 만든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콘텐츠”라면서 “지난 3월부터 준비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경남방언을 연구한 학자들과 방언권을 구분할 수 있는 표제어를 찾고, 또 이걸 퀴즈로 풀었을 때 고향을 맞출 수 있도록 통계학 교수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했는데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말했다.
독자들은 다행히 고생을 알아줬다. 인터랙티브 콘텐츠 특성상 포털을 통한 유통이 불가능함에도 자체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만 20만명 가까운 독자들이 찾아와 방언 콘텐츠를 즐겼다. 박진국 기자는 “특히 젊은 독자들이 많이 유입됐다”며 “대부분 10분 정도 콘텐츠 안에 머물렀다는 것도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KBS도 지난달 초부터 아나운서실이 기획한 프로그램 ‘言 the Quiz(언더퀴즈)’를 주에 한 차례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다. 이승연, 김보민, 오언종 아나운서가 연예인들과 함께 우리말 퀴즈를 풀면서 성공한 문제만큼 연예인 이름으로 소아병동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승연 KBS 아나운서실 팀장은 “KBS 아나운서들이 한국어부서까지 두고 우리말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염된 우리말을 지키기엔 역부족”이라며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쉽고 재밌게 우리말을 전할 수 있을까란 고민에서 이번 프로그램이 출발했다. 다행히 10~20대 구독자들이 즐겁게 우리말을 배울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라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