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포털 조인트벤처(합작회사)가 첫선을 보인지 1년여가 흘렀다. 조선일보는 가장 먼저 네이버와 손잡고 지난해 2월 ‘잡스엔’을 세웠다. 블로그 기반에서 취업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네이버 주제판 ‘잡앤(JOB&)’으로 유통하는 방식이다.
당시 잡앤은 론칭 19일 만에 정기 구독자 100만명을 확보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많은 언론사가 네이버에 제안서를 내밀었지만 지금까지 7곳만 설립됐다. 조선일보를 뒤이어 그해 6월 매일경제가 여행(여행플러스), 7월 한겨레가 영화(씨네플레이), 중앙일보가 중국(차이나랩)을 주제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3월에도 EBS는 초등교육(스쿨잼), 동아일보는 비즈니스, 4월 한국경제는 농업(FARM·아그로플러스)으로 네이버 주제판을 오픈했다. 현재 경향신문도 공연·문화·전시 등을 테마로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 조인트벤처 바람이 불자 언론계는 기대만큼 큰 우려를 보였다. 새로운 온라인 수익 모델을 만들더라도, 모바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네이버에 이용만 당할 것이란 걱정에서다.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자 역할에 그쳐 결국 포털 종속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또 네이버가 투자라는 이름으로 특정 언론사에만 특혜를 주며 길들이기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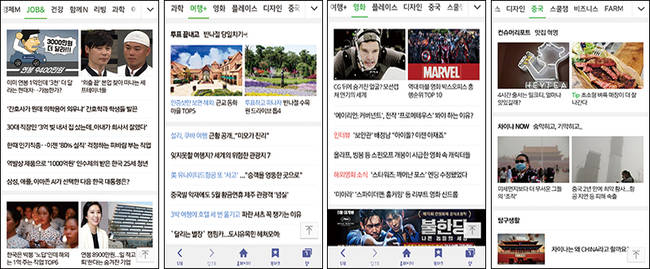
▲지난해 2월 조선일보 ‘잡스엔’을 시작으로 언론사와 네이버의 조인트벤처가 잇따라 설립됐다. 벤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자평할까. 사진은 조선일보 ‘잡앤’(왼쪽부터 서비스 시작 순으로), 매일경제 ‘여행+’, 한겨레 ‘영화’, 중앙일보 ‘중국’ 주제판의 모바일 화면.
먼저 수익면에서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간 언론사가 온라인 투자를 고민할 때마다 수익이 발목을 잡았다. 당장 경제적 대가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버 조인트벤처는 매년 최소 10억원 가량을 손에 쥘 수 있다. 네이버가 콘텐츠 전재료, 주제판 운영 대행,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광고나 부대사업으로 추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하루 순 방문자가 대략 30~40만명 이상이 적용 대상인데 현재 잡앤, 여행+, 영화가 여기 해당된다. 백강녕 잡스엔(잡앤) 대표는 “콘텐츠 속 배너 광고, 채용공고 등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다”며 “직업 카테고리에선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본다. 사업 영역을 다각도로 확장하면서 다국어 서비스 등 해외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뿐 아니라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됐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정민 씨네플러스(영화) 대표는 “모바일·온라인 콘텐츠 생산, 운영 방법을 터득하며 노하우를 쌓고 있다”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친절하게 설명하면 좋은 반응을 얻는다는 등 본지 뉴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여행플러스 대표도 “모바일 콘텐츠의 속성과 수요자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포털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면서 모바일 환경에서 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합류한 언론사들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우덕 차이나랩(중국) 대표는 “종이신문의 생명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며 “이 콘텐츠 실험이 본지 ‘디지털 퍼스트’의 자원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아그로플러스(농업) 대표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언론사가 얻게 될 혜택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언론사와 네이버 간 조인트벤처 분야 확장에 대해선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백강녕 잡스엔 대표는 “지난해 초 잡앤을 론칭할 때 네이버 주제판은 15개 정도였지만 지금은 두배로 늘어났다”며 “웬만한 주제들이 이미 등장한 터라 새로운 주제를 찾고 구독자까지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정우 네이버 홍보팀 부장은 “많은 언론사가 제안을 해왔지만 이용자에게 선택을 받아 생존해야 하는 영역이다 보니 벤처 설립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경쟁력 있는 주제라면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무조건 사업을 늘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