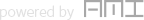재난보도 시스템 선진화 필요
국가재난방송 개념 돌아봐야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언론의 보도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난상황에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주최한 ‘재난보도-언론의 역할과 책임’ 세미나에서는 언론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최근 경주 지진까지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연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먼저 재난보도에 있어 시스템이 구비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올해 지진 보도의 경우 신속하게 지진을 보도할 수 있는 재난보도 시스템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면서 “무선 방재망 시설도 없었고 통신망도 민간에 있었다. 재난에 대한 특수 라인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사의 생중계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우 지진이 일어나면 주관방송사인 NHK를 비롯해 모든 민간방송이 최소 4분 이내에 재난방송에 들어간다”며 “‘슈퍼임포즈’라는 기술을 이용해 한 화면에 문자나 도형, 지도 등 다양한 재난 정보를 전한다. 반면 한국은 제대로 된 자막 시스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재난보도의 과장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문석준 포항CBS 기자는 “경주 지진을 보도할 때 일부러 무너진 곳을 찾아가서 영상을 찍거나 걱정된다는 의견을 억지로 유도해 리포트를 제작한 적이 있다”면서 “기사 생산자로서 기사를 위한 기사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김진두 YTN 과학기상팀장도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면서 보도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며 “재난방송조차 자극적인 그림을 보도하는 곳에 시청자들이 몰린다”고 말했다.
홍은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는 기자의 안전을 문제 삼았다. 홍 교수는 “지난달 태풍 ‘차바’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취재차량이 물에 떠내려가는 영상이 나오거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도저히 리포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연결을 시도하는 장면 때문이었다”며 “공익적인 측면에서 재난의 위험성과 대피방법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자의 안전 문제가 쉽게 간과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재난보도-언론의 역할과 책임’ 세미나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이연 교수도 “훈련과 교육을 통해 재난보도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재난보도 콘텐츠도 개발해야 한다. 아사히 신문의 경우 ‘그 때 그 시절’이라는 특집을 통해 고베 지진을 상기한다. 우리도 지난 재난을 너무 쉽게 잊지 말고 되짚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보도와 관련된 법·규제 등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진두 팀장은 “국가재난방송사에 대한 개념을 손봐야 한다. KBS가 재난주관방송사지만 옥상옥이라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편성을 깨고 곧바로 재난방송을 하기 힘든 구조”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제로 편성을 깰 수 있도록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영역을 넓혀 재난방송을 빨리 편성할 수 있는 매체를 지정해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