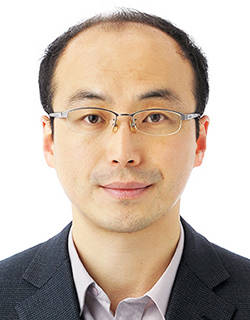
▲손제민 경향신문 워싱턴특파원
돈 문제만은 아니었다. 영국 여성인 미드와이프에게 외국인으로서 이러한 혜택을 누려도 괜찮으냐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돌아온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아기를 낳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 같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살았던 곳은 남해안의 리버럴한 브라이튼이었다. 브라이튼은 이번에 잉글랜드의 다른 도시들처럼 유럽연합(EU) 잔류에 투표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영국의 금융산업을 강타한 뒤였고, 지금처럼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이 아주 가끔 신문의 한 귀퉁이에 고개를 들이밀 때였다. 하지만 영국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유럽의 통합 분위기에 다소 거리를 두고 ‘영국적인 것’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하기는 했지만 한국, 미국만큼 민족주의나 애국주의가 강하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바다 건너 프랑스 등에서 ‘다문화주의의 실패’가 유행처럼 거론될 때에도 영국은 대륙국가들과 구별되는 비교적 잘 규율된 이민 정책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특히 무슬림들에 대한 포용 수준이 최악은 아니었다.
그로부터 8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다.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반 이민자 정서를 보면 내가 알던 영국이 더이상 아닌 듯하다. 버스 정류장에서 히잡을 쓴 한 여성이 아들에게 하던 대화를 들은 영국 백인 남성이 “영국에 있으면 영어로 얘기하라”고 하자, 옆에 있던 다른 승객이 “이 여성은 지금 웨일스어로 말하고 있다”고 두둔해 남성이 머쓱해했다는 에피소드가 대표적이다.
영국 사회의 이민자 유입에 대한 반감을 부추긴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다. 그는 보수당 집권에 성공했던 2010년 총선 때 연간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를 10만명 이하로 묶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영국의 개방된 노동시장을 고려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 해마다 그 약속보다 3배에 달하는 이민자가 유입됐다. 그런 점에서 이번 투표 결과 그가 사임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자업자득이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커진 영국인들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희생양 삼는 분위기에 일조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그것이 금융위기의 여파였는지, 세계화라는 더 큰 힘의 필연적 귀결인지 모르지만 영국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브렉시트 직전 발행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실업률은 5%로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일을 하면서도 절대 빈곤선 이하를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1년 이후 50%를 넘어섰다. 주택비를 제외한 가처분 소득으로 따졌을 때의 통계이다. 이는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가속화됐다.
비슷한 일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브렉시트는 공교롭게도 미국의 트럼프 현상과 함께 나타났다. 두 나라는 의료보험 체계처럼 차이점이 유사점보다 더 많지만 두 현상은 근본에 있어서 유사하다. 트럼프는 “세계주의라는 거짓된 노래(false song of globalism)”를 외치며 유권자들을 선동한다. 브렉시트 캠페인을 주도한 영국의 극우 정치인들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
브라이튼에 지역구를 둔 녹색당 소속 정치인 캐롤라인 루카스가 최근 가디언 기고를 통해 전한 브라이튼의 삶은 이렇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줄어들고, 문을 닫는 아동복지센터들이 생겨났고, 병원 줄이 더 길어졌다. 우리를 보살펴준 그 미드와이프는 잘 지내고 있는지.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