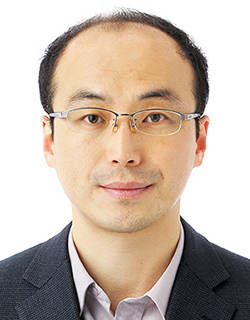
▲손제민 경향신문 워싱턴특파원
“70년 전 이맘 때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 섬에 상륙해 수십만명의 군인은 물론 수십만명의 민간인들을 죽였다. 그 해병대가 지금도 오키나와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오키나와인들은 우선 자신들을 희생시킨 일본 정부를 탓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오키나와의 후텐마기지를 없애기는커녕 섬 안의 다른 곳에 기지를 지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공사를 막아내고 있다. 미국이 체면을 구기지 않고 출구를 찾는 유일한 길은 ‘19년이나 해봤는데 잘 안되네.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하는 것이다. 혹시 그럴 생각은 없나?”
아베 신조 총리의 방문을 앞두고 미·일 안보동맹을 논의하는 이 자리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깬 이 일본인은 차마 “미국을 탓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미국은 수많은 민간인을 죽인 ‘전범’ 행위에 책임을 느끼고 오키나와 군사기지 추가 건설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시어 차관보는 ‘애초 후텐마기지로 인한 오키나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여러 대안을 검토해본 결과 오키나와 헤노코에 대체기지를 짓는 게 최선이라고 양국 중앙정부가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 때까지 여유있게 질문을 받던 시어 차관보는 잠시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
비슷한 시각 이 연구소의 길 맞은 편 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 고창훈 제주대 교수 등이 미국, 일본 법학자들과 제주 4·3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강 주교는 “2002년 서울에서 제주교구장으로 내려가기 전만 해도 제주도에서 오래 전에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살면서 그것은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와 같은 것이었다는 걸 알고 그 때까지의 무지에 죄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4·3 관련 진정한 화해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 비극에 결정적 역할을 한 미국에서도 취해져야 한다”며 미국도 참여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주교는 한국 독재정권이 반세기나 기억을 억압하고, 냉전 속에서 말을 꺼낼 기회도 없었지만 이제는 미국의 책임도 얘기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했다.
2003년 고건 국무총리가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채택한 4·3 조사보고서는 1947년 3월~1954년 9월까지 3만명 가까운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이 사건을 ‘공산주의자의 책동’으로 규정하며 학살을 승인한 미군정청과 군사고문단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당시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4·3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적도 없다.
기억하기 불편할 정도로 너무 어두운 일이어서일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어서일까. 두 사안 모두 해당 지역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잊고 살고 중앙정부도 별로 돌보지 않는다. 심지어 중앙정부들의 최근 태도는 이 비극에 상처를 덧내는 것 같다. 한국, 일본 정부가 식민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워싱턴에서 외교력과 돈을 집중 동원해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데 주력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은 양국 주류언론의 관심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두 사례는 어떠한 과거사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른 과거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오키나와는 지금도 주일 미군기지 75%를 떠안고 있고, 제주도는 많은 도민들의 반대에도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70% 정도 진행됐다. 무엇보다 이 일들은 미국이 늘 강조하는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는 미국의 정치인, 관리들은 이러한 호소에 언제나 짐짓 충고하듯이 ‘미래지향적’ 태도를 주문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제3자이고 해당국이 각자 알아서 처리할 국내정치 문제로만 본다. 그러나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한 미국인들은 앞으로도 자유로워지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권력행사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억울하게 사라져간 원혼들로부터 말이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