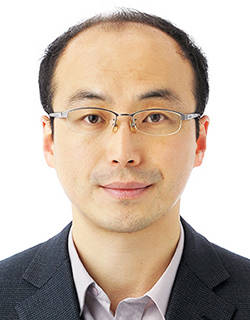
▲손제민 경향신문 워싱턴특파원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적이 있는 줄리아니는 오바마가 이달 초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슬람국가(IS)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끔찍한 폭력을 저지른 것은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오바마는 이 자리에서 타 종교를 비난하기에 앞서 중세의 십자군전쟁과 종교재판, 미국의 노예제와 인종차별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공직자를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인종주의적 발언만큼이나 민감한 소재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그 정도 지위를 이룬 사람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유산을 날려버리는 발언을 하다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줄리아니를 ‘인종주의자’로 매도하는 비난도 쏟아졌다. 줄리아니는 “오바마는 백인 어머니에게 자랐고, 백인 학교에 다녔고, 그가 아는 대부분의 것을 백인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내 발언이 인종주의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옹색하게 방어했다가 또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줄리아니의 발언에 거리를 두면서도 내심 속시원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수진영 입장에서 오바마에게 쌓였던 불만을 표출해줬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임기 초부터 미국의 대외관계 정체성과 관련해 공화당과 불협화음을 겪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예외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발언했다가 공화당의 반발을 샀다. 그리스, 영국 등 모든 나라가 각자 예외적이며 미국 예외주의도 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별나지 않다는 얘기였다.
오바마가 미군의 해외 군사개입에 좌고우면하거나 중동과 동유럽 등에서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공화당은 오바마의 ‘유약한 외교’를 비난했다. 오바마가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핵협상을 끈질기게 추진하고 지난 반세기동안 미국의 쿠바 고립전략이 실패했다며 쿠바와 관계정상화를 시작한 것도 독재정권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중앙정보국(CIA)의 테러용의자 심문 방식이 ‘고문’과 다름없다는 상원 조사보고서를 승인한 것도 비슷한 차원에서 반발에 직면했다.
공화당의 오바마 비판의 공통점은 오바마가 지나치게 도덕주의적이고 성찰적이어서 국익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때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의 애국심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바마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바마는 미국이 가진 상대적 지위의 하락 등 변화한 국내외 환경에서 아주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인 대외정책을 외치는 쪽은 공화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공화당은 오바마가 IS 문제로 개최한 ‘폭력적 극단주의 대처를 위한 정상회의’의 이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용어 대신 ‘폭력적 극단주의’를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무엇이 두려워 이슬람이란 말을 쓰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오바마의 의도는 분명하다.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의 문제가 이슬람교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지키려는 것뿐만 아니라 IS 등을 대다수 이슬람교도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이롭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시마저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승인한 뒤 “이 전쟁은 이슬람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오바마의 대외정책에 대한 태도가 역대 대통령들과 많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는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역량을 집중할 곳은 해외 군사개입보다 국내 의료보험을 확대하고 이민자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역대 최고에 달한 불평등 해소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외부의 적에 더 집중하는 데서 존재 이유를 찾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애국인지는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깨닫고 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