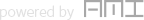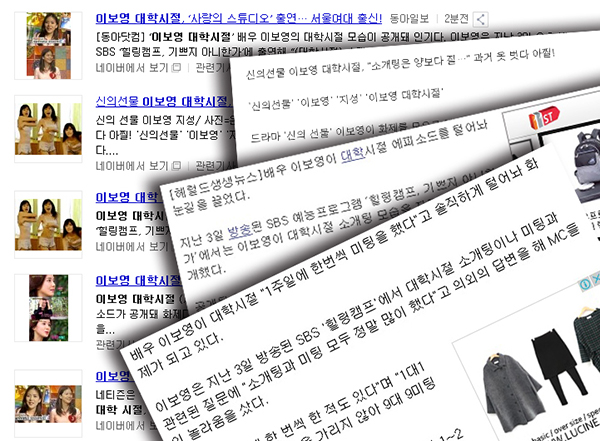 |
||
| ▲ 주요 언론사닷컴들은 네이버 뉴스검색에서 검색어 기사가 걸리기 위해 네티즌 반응을 과도하게 다루는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 ||
검색어 기사에서 네티즌 반응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검색어 기사를 만드는 ‘숨겨진 공식’ 때문이다.
검색어 기사가 네이버 뉴스검색에서 잡히기 위해선 기사 내용에 실시간 검색어가 4~5번 이상 노출돼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네티즌 반응을 3번 이상 언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4일 인기 검색어 중 하나인 ‘이보영 대학시절’과 관련된 검색어 기사를 보면, ‘이보영 대학시절’이란 단어가 제목과 사진설명에 각 1차례씩 나오고 네티즌 반응에 3차례 언급되는 동일 패턴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가 검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사 내용 중 동일 단어 중복에 대한 횟수를 늘린 것인데, 언론사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간파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검색어 기사는 취재보단 이런 공식에 따라 만들어지다 보니 회사만 다를 뿐, 내용과 형식이 똑같은 ‘판박이 기사’가 대부분이다. 네티즌들이 검색어 기사를 빗대어 컴퓨터 자판에서 복사·붙이기를 뜻하는 ‘콘트롤(ctrl)+C’, ‘콘트롤(ctrl)+V’기사라고 일컫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색어 기사의 또 다른 특징은 기사의 ‘바인 라인’에 기자 이름 대신 회사 이름이 자리 잡고 있는데, 대부분 인턴기자 손에 맡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언론사 온라인담당 고위 간부는 “검색어 기사 생산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인데, 기자들한테 맡기면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사 온라인 사이트의 트래픽을 위한 일이지만, 언론사 스스로 먹칠할 수 없다는 속셈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의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인턴기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부분 언론사 닷컴에는 10여명에서 적게는 1명가량, 검색어 기사를 생산하는 전담 인턴기자를 두고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언론사닷컴은 자체 기자 인력으로 검색어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검색어 유혹에 빠지지 않은 언론사는 사실상 손에 꼽힐 정도다.
특히 인턴 기자들의 경우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상명하복식 언론조직 문화 탓에 문제제기조차 못한 채 검색어 기사 생산에 동원되고 있다. 그런 사이 인턴기자들이 정작 배우고 싶은 실무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기자 정신’을 갈취 당하는 셈이다.
그나마 검색어 기사로 동원된 인턴기자 중 정식 기자로 채용된 경우는 가뭄에 콩 나듯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인턴 기자들은 하루에만 20~50개의 검색어 기사를 찍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대부분 언론사가 트래픽 경쟁을 위해 공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사정을 뻔히 아는 언론사닷컴 입장에선 트래픽을 통한 온라인 광고매출마저 아쉽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검색어 기사가 과거엔 연예뉴스나 TV 인기 프로그램 기사에 국한됐지만, 점차 사회·정치기사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색어 기사 등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이 멍들고 있지만, 온라인 광고매출과 온라인뉴스 책임자들의 ‘자리보전’ 등을 위해 언론계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게다가 주요 원인을 제공한 네이버마저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색어 기사를 타고 자사 사이트에서 다른 기사를 읽고 간 비율은 2% 내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네티즌들이 해당 언론사 인터넷사이트에 머물기 보다는 검색어 기사만 보고,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사 입장에선 이미지만 나빠지고 페이지뷰에 대한 실익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반면 언론사닷컴들이 검색어 기사에 매달리면서 멀티미디어뉴스 등 온라인저널리즘의 새로운 시도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결과물인 트래픽이 적게 나오기 때문인데, 여기에 경영진이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명분까지 덧씌워지면서 온라인저널리즘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경영진들은 트래픽이 올라가면 매출과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악화’인 검색어 기사가 ‘양화’인 양질의 온라인저널리즘을 구축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광고매출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언론사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저널리즘의 도전 기회마저 잃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