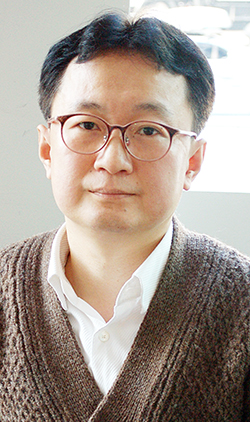 |
||
| ▲ 최혁곤 경향신문 기자 | ||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바쁜 기자 생활이지만 소설을 집필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다”는 최 기자. 해마다 끊이지 않고 단편소설을 내놓았지만 장편소설은 지난 2006년 ‘B컷’ 이후 7년만이다. 지난 3년간 틈틈이 준비한 그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쓰고 싶었다”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삶에 대한 애환을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최 기자의 소설은 ‘사회파 미스터리’에 가깝다. 범죄가 발생한 사회적 동기를 추적하며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들춰낸다. 두 작품의 내용은 다르지만 제목의 ‘B’가 공통된다. B컷은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진을 뜻하고, B파일은 소설 속 사회에서 쓸모없는 ‘잉여인간’의 의미로 쓰였다.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마이너 인생을 사는, 사회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이 대다수다. 살인 누명을 쓴 조선족, 트랜스젠더 킬러, 사업에 실패한 제비족, 가정이 붕괴된 형사, 보스에게 버림받은 조직원, 왕년의 인기에 집착하는 한물간 여배우 등이다. “B는 처절한 생존을 위해 음지로 내몰린 B급 인생들의 상징”이라는 최 기자는 “추리의 재미뿐 아니라 사회의 가려진 모습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긴장감, 속도, 반전 등 추리소설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의 상상력을 더하지만, 그 바탕에는 기자로서의 현실적인 감각이 있다. 사실적인 배경묘사가 손꼽히는 그는 “장면을 꼼꼼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한다. 기자로서 평소 많은 정보를 접하는 일상도 도움 된다. “단신 기사들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큼지막한 기사는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알지만, 단신 기사는 묻히는 기사들이 많죠. 이걸 엮으면 하나의 또다른 복합적인 구조가 되죠.”
롤모델은 ‘여명의 눈동자’로 유명한 김성종 작가다. 어렸을 때부터 추리소설 마니아였던 최 기자는 “어릴 적 ‘최후의 증인’을 읽지 못했다면 추리작가의 꿈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작가가 1986년 추리문학상 대상 수상자라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더욱 값지다. 인간관계를 통해 ‘따뜻한 미스터리’를 쓰는 일본 추리작가 요코야마 히데오도 좋아한다. 신문기자와 사회파 미스터리를 추구하는 점이 최 기자와 꼭 닮았다.
한국에서 장르 소설의 토양은 척박하다. 비주류 문학인 장르 소설은 B급 문학으로 여겨진다. 추리소설은 일본과 달리 영미권을 그대로 답습해 뿌리가 약하다. 추리작가 수도 절대 부족하다. “100만부를 팔 인기 작가보다 초쇄를 내고 꾸준히 활동할 작가 100명이 필요하다”는 최 기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장르 작가들은 고급 문학을 추구하기보다 문화 자체를 즐긴다.
“장르 소설은 장점이 많아요. 엄격한 문학적 기준을 요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높지 않죠. 누구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다양한 콘텐츠 활용도 유리하죠.”
올해 10월에는 공동으로 ‘조선의 명탐정들’을 출간했다. 실록 등 역사서에서 발췌한 조선시대 사건을 미스터리로 엮었다. 내년에는 연작으로 발표하고 있는 ‘밤의 노동자’를 출간할 예정이다. ‘B’시리즈 일환으로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도 다룰 예정이다.
“소설이 아니라 이야기를 판다”는 최 기자. 형식이 글일 뿐, 얼마든지 영화, 만화 등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 20대 시절부터 7전8기 끝에 30대에 추리작가가 된 그는 글쓰기에 집착하기보다 오롯이 “즐기는” 작가가 되고 싶단다. “나이 들어서도 초쇄, 2쇄 정도만 팔 수 있으면 되지 않냐”고 웃는 그다. “장편 추리소설을 꾸준히 발표하고 싶어요. 쉬워 보여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죠. ‘조선의 명탐정들’처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퓨전 역사교양서도 또 써보고 싶어요.”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