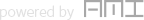|
||
| ▲ 손관수 KBS 상하이 특파원 | ||
지난 6월4일로 천안문 사건은 23주년을 맞았고 이를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집회가 시위가 보장된 홍콩에선 무려 18만 명이 모인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려 ‘천안문사건에 대한 재평가’(平反 六四)를 요구했다. 특히 홍콩애국시민지원연합회(지련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천안문 사건의 직접 피해자로 올해 45살인 팡 정(方政)이 참여해 큰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팡 정씨는 89년 당시 베이징 체육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천안문 광장 연좌시위에 참여했다가 진압군의 탱크에 깔려 두다리를 잃은, 본인의 말로는 ‘행운의 생존자’였다. 무릎 아래 두다리를 잃은, 건장한 상체를 가진 중년의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만으로도 그는 천안문 사건의 아픔과 안타까움, 슬픔과 분노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홍콩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천안문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중국의 민주주의가 없으면 홍콩의 민주주의도 없다.’ 중국 민주화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 이면에 바로 이 홍콩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중국 대륙에서도 천안문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5월말엔 천안문 사건때 아들을 잃은 73살의 야웨이린이 “죽음으로 정부에 항의하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지난 6월 6일엔 천안문 사건으로 20년 넘게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해 풀려난 후난성의 노동운동가 62살 리왕양이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목을 매 자살했다는 리왕양 사건의 경우 발견 당시 사진에서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점 때문에 타살 논란이 일더니 사건 발생지의 공안 관계자조차 타살 의혹이 있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확산돼 ‘천안문 사건’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과연 천안문 사건을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제1차 천안문 사건이라 할 1976년 사태를 되짚어보면 여러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의 사망 이후 주자파(走資派)가 비판을 받는 등 보수파가 득세하자 시민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 저우 총리를 추모하며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후 4인방으로 몰려 몰락한 보수파는 당시 이를 강경진압하고 그 책임을 물어 당 부주석이자 부총리이던 덩샤오핑을 실각시켰다.
그러나 곧이어 마오쩌뚱이 사망하자 덩샤오핑은 기적처럼 부활했고 바로 그 주자파의 힘을 모아 역사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78년 개혁·개방을 결정한 역사적인 회의에서 76년의 ‘천안문 사태’도 ‘혁명적인 행동’이었다는 재평가, 역사적 반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제2차 천안문 사건 당시의 실력자는 바로 덩샤오핑이었다. 무력 진압에 대한 최종 결정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1차 천안문 사건의 피해자인 그의 몫이었다. 개혁·개방의 화신 덩샤오핑이었지만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이 몰고 온 동유럽의 전환과 몰락 분위기는 결국 그에게 강경진압이라는 또 다른 ‘중국의 역사적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천안문 사건 5개월 뒤인 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사회주의 동유럽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고,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도 91년 12월 붕괴되었다. 역사는 천안문 사건을 단선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富)가 축적되면서, 그것도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놀라운 크기로 축적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있고 그 한가운데에 바로 ‘천안문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G-2로 부상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역설적으로 이러한 갈증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다.
민주 개혁 요구를 체제 유지를 위해 깔아 뭉갠 천안문 사건이 23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21세기 중국의 길을 되묻고 있다. 손관수 KBS 상하이 특파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