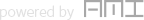|
||
| ▲ 엄민용 경향신문 엔터테인먼트부 차장 | ||
“제가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닌데, 자꾸만 몸이 불고 있어요” “평소에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만 먹으며 체중을 조절하다 보니 체중이 불지 않는다” 따위처럼 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말에서 ‘불다’는 아래의 뜻으로 쓰입니다.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
동풍이 부는 날. / 따뜻한 바람이 불다. /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유행·풍조·변화 따위가 일어나 휩쓸다.
사무실에 영어 회화 바람이 불다.
△입을 오므리고 날숨을 내어 보내어, 입김을 내거나 바람을 일으키다.
유리창에 입김을 불다. /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다. / 뜨거운 차를 불어 식히다.
△입술을 좁게 오므리고 그 사이로 숨을 내쉬어 소리를 내다.
휘파람 부는 아이. / 그는 휘파람을 불며 산책을 했다.
△코로 날숨을 세게 내어보내다.
소가 콧김을 불다.
△관악기를 입에 대고 숨을 내쉬어 소리를 내다.
대금을 부는 악사. / 피리를 불다.
△풀무·풍구 따위로 바람을 일으키다.
풀무를 불다.
△숨겼던 죄나 감추었던 비밀을 사실대로 털어놓다.
경찰에게 지은 죄를 낱낱이 불다. / 우리에게 네 죄를 숨김없이 불어라.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사용례에서 보듯이 살이 찌거나 몸무게가 는다는 의미가 눈곱만큼도 없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라거나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라는 뜻의 말은 ‘붇다’입니다. “콩이 붇다” “개울물이 붇다” “체중이 붇다” 따위로 쓰이죠.
그런데 ‘붇다’를 비롯해 ‘묻다’ ‘듣다’ ‘걷다’ 등처럼 어간 말음에 디귿(ㄷ) 받침이 있는 말은 활용할 때 특이한 형태를 띱니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디귿(ㄷ)이 리을(ㄹ)로 변하는 것이죠.
“물어 보았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쁘다” “그 길을 걸은 적 있다” 따위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음 앞에서는 ‘ㄷ’이 ‘ㄹ’로 바뀌지 않습니다. “묻지 않았다” “듣고 있다” “2시간 걷자니 다리가 아프다” 등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서 예로 든 ‘몸이 많이 불었다’ ‘체중이 불어 걱정이다’ 등의 ‘불었다’와 ‘불어’는 바른말입니다. ‘불은 몸’으로 쓸 수도 있지요.
하지만 ‘몸이 불고 있어요’ ‘체중이 불지 않는다’ 따위처럼 쓰지는 못합니다. ‘몸이 붇고 있어요’ ‘체중이 붇지 않는다’로 써야 하는 것이죠. ‘묻고 있어요’를 ‘물고 있어요’로, ‘듣지 않아요’를 ‘들지 않아요’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붇다’를 ‘(몸이) 불고 있다’나 ‘(체중이) 불지 않는다’로 잘못 쓰는 것과 같은 유형으로 틀리게 쓰는 말은 참 많습니다.
“라면이 불기 전에 먹어라” “물을 많이 부었더니 국수가 불고 말았다” 등의 ‘불기’와 ‘불고’도 ‘붇기’와 ‘붇고’로 써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를 뜻하는 말은 ‘불다’가 아니라 ‘붇다’이니까요.
또 “전이 눌지 않도록 부쳐라” 역시 “전이 눋지 않도록 부쳐라”로 써야 합니다. “누런빛이 나도록 조금 타다”를 뜻하는 말이 ‘눋다’이기 때문이지요. 이 ‘눋다’가 모음을 만나면 ‘눌어’ ‘눌은’ 등이 되는데요. ‘눌은밥’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밖에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길고 있다”도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긷고 있다”로 써야 합니다.
<엄민용 경향신문 엔터테인먼트부 차장>
엄민용 경향신문 엔터테인먼트부 차장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