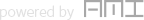|
||
| ▲ 엄민용 경향신문 엔터테인먼트부 차장 | ||
수년 전부터 ‘장애우’라는 말이 부쩍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에 비해 아주 친근하게 들리니, 그렇게 쓰자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장애우’는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했지만, 정작 당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선 장애우의 ‘우’가 문제입니다. ‘우’가 ‘벗 우(友)’이니, ‘장애우’는 “장애를 가진 친구”를 뜻하게 됩니다. 이는 자칫 장애인을 비사회인으로 격리하는 의미를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집단 또는 계급․계층을 표현하는 개념이나 낱말은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나 ‘여성’이라는 말은 남들이 나를 가리킬 때뿐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우’는 타인이 나(장애인)를 지칭하거나 부를 때에는 쓸 수 있으나, 내(장애인)가 나를 지칭할 때에는 절대 쓸 수 없는 말입니다. 1인칭으로는 못 쓰는 것이지요.
따라서 ‘장애우’는 사회집단 또는 계급․계층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장애인을 비사회적 집단으로 나타낸 말인 셈입니다. 또 ‘장애우’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비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일반적인 예의에도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지닌 70대 어르신께 스무 살쯤 먹은 젊은이가 ‘친구’라고 부른다면, 그보다 버릇없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 단체는 ‘장애자’와 함께 ‘장애우’라는 말을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장애우’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장애인을 정성껏 돕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애우’가 바른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그냥 ‘장애인’일 뿐입니다.
‘장애인’과 대립하는 말로 ‘정상인’을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자칫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생각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장애인과 대립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비장애인’입니다.
장애와 관련해 ‘귀머거리’ ‘장님(봉사․소경)’ ‘벙어리’ 등의 말도 조심해 써야 합니다. 이들 말에는 사람을 깔보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귀머거리는 청각장애인을, 장님․봉사․소경 등은 시각장애인을, 벙어리는 언어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거든요.
예부터 ‘하늘 아래 사람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업신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말에 ‘벙어리장갑’이 있고, “귀머거리 삼 년이요 벙어리 삼 년이라”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장님 문고리 잡기”라는 속담도 있고요. 따라서 이들 말을 아예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벙어리장갑’을 ‘언어장애인 장갑’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요.
어느 물건이나 어떤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벙어리’ 등에는 누구를 비하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벙어리’ 따위의 말을 쓰면, 자신은 그럴 뜻이 없었더라도, 결국 그 사람을 낮춰 부른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흔히 ‘언챙이’라고 잘못 쓰는 ‘언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청이 퉁소 대듯”이나 “언청이 아니면 일색” 등의 속담이 있으니, 비유적 의미로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는 ‘구순열’ 또는 ‘구개열’ 장애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밖에 ‘일반인들의 평균보다 유난히 키가 작은 사람은 ‘난쟁이’가 아니라 ‘왜소증 환자’ 또는 ‘성장장애인’이라 불러야 하며, 특히 ‘나환자’나 ‘한센인(Hansen人)’으로 불리는 사람을 ‘문둥이’로 일컬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엄민용 경향신문 엔터테인먼트부 차장>
엄민용 경향신문 엔터테인먼트부 차장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