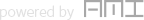|
||
| ▲시사IN 신호철 기자. | ||
지난달 우리 잡지에 법률 용어에 관한 기사를 쓴 적 있다. 대중이 ‘구형’과 ‘선고’라는 두 단어를 혼동하는 일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였다. 기사가 나간 뒤 많은 독자가 이메일과 댓글을 보내왔다. 대부분은 “맞다. 나도 헷갈렸다”라며 공감을 표하는 것이었다.
양식 있는 성인이 ‘구형’과 ‘선고’를 구분 못한다는 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부딪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법학 교수조차도 “인터넷에 뜬 제목을 스쳐 지나가면서 볼 때는 나도 구형 보도와 선고 보도를 혼동할 때가 있다”라고 말했다.
구형이 혼동을 주는 이유는 어감 상 ‘형을 부른다(口刑)’라는 뜻에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이 중요한 결론을 냈다는 느낌도 준다. 구형량과 선고량이 큰 차이가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요즘처럼 구형과 선고의 격차가 클 때는 이 문제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구형이라는 단어가 자칫하면 검찰의 여론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구형이라는 말은 일본식 조어로 형법에는 없는 말이다. 형사소송법 302조에 검찰의 ‘의견 진술’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구형이라는 말은 형법에 없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구형은 법원 판결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일본 언론은 한자로 求刑이라고 쓰기 때문에 뜻을 혼동할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한자를 쓰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대안은 검찰 발 구형 보도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을 때, ‘징역 5년’이라는 강한 문장이 온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뉴스 메인화면을 장식했다. 하지만 유독 ‘중앙일보’는 이 구형 기사를 쓰지 않았다. 담당 기자는 “구형 보도는 선고 보도 보다 가치가 낮기 때문에 뒤로 밀렸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기자는 뒤에 정연주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는 자세한 기사를 썼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형 보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용어로 바꿔보면 어떨까. 법학 교수들은 “검찰이 OO형을 요청했다”, “OO형을 요구했다”라고 바꿔써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했다. 법조 출입기자들이 이런 말을 쓰기에는 처음에 거부감이 들겠지만, 법률 용어 순화에 바람에 맞춰 언론계 스스로 쉬운 말을 쓰면서 독자에게 오해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신호철 시사IN 기자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