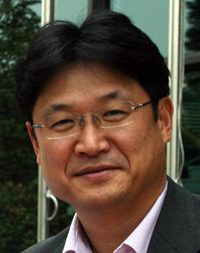 |
||
| ▲ 성동규 교수 | ||
지난 9월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먹여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서 떠들썩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니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다가가 어깨에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라고 말한 동영상은 그저 치기어린 학생의 철없는 행동 정도로 여기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런 가운데 터진 것이 이른바 나영이 사건이다. 술 취한 범인이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하여 평생 회복될 수 없는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더욱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다. 워낙 사건의 충격이 크다 보니 대통령까지 나서 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성범죄자에게는 유럽에서 시행한다는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에 골목길에 늘고 있는 CCTV 설치로 인해 관련산업 제조업체 주식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만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가해자인 조두순의 이름을 따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지난 10월5일 중앙일보를 필두로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등이 나영이 사건이란 명칭을 쓰지 않고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 조두순 사건으로 고쳐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을 최초 공개한 KBS등 일부에서는 가명을 써서 표현했기에 그냥 나영이 사건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지만 가해자 이름을 쓰는 것은 참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보기에 따라서는 별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별 일도 아닌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화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기억속에서 사라졌을 뿐이지 그동안 경악을 금치 못할 유사사건들이 많았다. 90년대 초반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부남 사건’과 ‘김진관·김보은 사건’이 있었고, 불과 1년여 전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혜진·예슬이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가 피해자들인데 언론에서의 반복적인 노출과 호명으로 인해 평생을 또 다른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나영이의 주치의 역시 지난 주말 TV 심야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친구들이 그 아이이름을 부르며 놀릴 때 가장 슬퍼한다고 전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어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한 신선한 결정인 것이다. 사건 공개 이후 사회 모두가 달아오른 냄비처럼 뜨겁게 분노했을 뿐, 이제부터라도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 논의 수준 단계이므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언론의 몫이다.
아니 이러한 발상의 전환만이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 성범죄를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아직 성매매 같은 범죄행위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인식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만드는 데는 언론의 문제의식 결여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언론의 위기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이 진부한 명제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욕을 하지만 언론을 접한다. 이를 뒤집어 보면 희망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 희망은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국민을 어루만지는 입장에서 세상을 이야기해 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