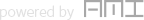지난달 15일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정보공개제도와 언론보도’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에서는 해외 정보공개제도의 현황이 보고돼 관심을 끌었다. 소개된 북유럽, 미국, 독일 정보공개제도의 요점을 간추려 본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보공개원칙을 성문화시킨 스웨덴 등 북유럽의 정보공개제도는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스웨덴은 1766년 헌법을 개정해 ‘정보공개원칙’을 세계 최초로 입법화했다. 1949년 제정된 ‘출판자유법’에 이 원칙은 성문화됐다. 스웨덴 역시 공개하지 않는 정보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개인적인 서신이나 서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무원의 서류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밀보호법’에도 정보 공개의 예외가 명시됐다. 그러나 비밀보호의 대상이 극히 한정돼 있으며 모두 법으로 명문화돼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충실하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담당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공개 가능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공무원들이 익명 또는 기명으로 행정부서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 언론은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미국은 1966년 ‘정보자유법’을 만든 뒤 4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지난해에는 이 법을 한층 강화한 ‘오픈정보자유법’을 제정했다.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적 보완 장치를 만들어 놨다. 신속한 정보공개를 돕는 별도의 행정관청인 ‘정보서비스청’을 뒀다. 자의적인 청구 거절을 막기위해 연방법무장관은 특별위원회에 관련 민사사건을 보고한다. 의회에는 전년도 민사사건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기관은 차관보급의 정보자유법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기관과 청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정보자유법 공공연락관’이란 직책도 있다. 비협조적인 공무원은 징계할 수 있다. 뉴스미디어에게는 청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언론의 입장을 반영했다.
독일 정보공개제도의 요체인 ‘정보자유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은 2006년에 제정됐으며 정보공개 범위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자유법은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정보 공개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때’ 등 8가지 경우에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독일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사례는 절대주의 국가와 히틀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뿌리 깊게 이어진 ‘비밀주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개 방식,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법적 쟁송 등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됐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보공개원칙을 성문화시킨 스웨덴 등 북유럽의 정보공개제도는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스웨덴은 1766년 헌법을 개정해 ‘정보공개원칙’을 세계 최초로 입법화했다. 1949년 제정된 ‘출판자유법’에 이 원칙은 성문화됐다. 스웨덴 역시 공개하지 않는 정보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개인적인 서신이나 서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무원의 서류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밀보호법’에도 정보 공개의 예외가 명시됐다. 그러나 비밀보호의 대상이 극히 한정돼 있으며 모두 법으로 명문화돼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충실하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담당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공개 가능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공무원들이 익명 또는 기명으로 행정부서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 언론은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미국은 1966년 ‘정보자유법’을 만든 뒤 4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지난해에는 이 법을 한층 강화한 ‘오픈정보자유법’을 제정했다.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적 보완 장치를 만들어 놨다. 신속한 정보공개를 돕는 별도의 행정관청인 ‘정보서비스청’을 뒀다. 자의적인 청구 거절을 막기위해 연방법무장관은 특별위원회에 관련 민사사건을 보고한다. 의회에는 전년도 민사사건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기관은 차관보급의 정보자유법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기관과 청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정보자유법 공공연락관’이란 직책도 있다. 비협조적인 공무원은 징계할 수 있다. 뉴스미디어에게는 청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언론의 입장을 반영했다.
독일 정보공개제도의 요체인 ‘정보자유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은 2006년에 제정됐으며 정보공개 범위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자유법은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정보 공개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때’ 등 8가지 경우에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독일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사례는 절대주의 국가와 히틀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뿌리 깊게 이어진 ‘비밀주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개 방식,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법적 쟁송 등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됐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