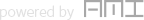국내, 명문화 되지 않아 사안 따라 판단
미국, 판례법상 발전된 ‘공인이론’ 규정
‘공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한마디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과 사인을 나누는 것은 비판의 수용 한도 그리고 익명보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인은 사회 통념상 공직자나 유명 인사 등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의 범주가 법률 등에 명문화되지 않아,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우리 판례에서 공적인물을 판단한 사례는 △유명한 친북 재미 언론인 △시·도의회 의원 △중견 언론인(TV 뉴스 앵커를 지낸 방송사의 보도국 차장)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 △공영방송 PD △야구선수(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의 한국인 야구선수) △대기업 회장 △여대생시절 전대협 대표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해 세간에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미국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공인이론’은 판례법상 발전된 것으로, 오보에 의한 명예훼손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언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 혹은 완화하기 위해 출발했다.
공인이론에선 △대체로 선거직이나 그 후보자, 정부의 중요정책 결정자, 검찰·경찰·군 고위 간부 등을 일컫는 ‘공직자’(Public Official)와 △유명인사로 불리는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대기업 총수 등 ‘전면적 공적 인물’(Pervasive Public Figure)이 있다.
그리고 △공직자나 유명인이 아니지만 어떠한 지위와 관련된 보도에 의해 혹은 특정한 공적 논쟁에 참여함으로써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인 ‘제한적인 공적 인물’ 혹은 ‘논쟁에 관련된 공적 인물’(Vortex Public Figure)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조차 공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미국, 판례법상 발전된 ‘공인이론’ 규정
‘공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한마디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과 사인을 나누는 것은 비판의 수용 한도 그리고 익명보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인은 사회 통념상 공직자나 유명 인사 등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의 범주가 법률 등에 명문화되지 않아,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우리 판례에서 공적인물을 판단한 사례는 △유명한 친북 재미 언론인 △시·도의회 의원 △중견 언론인(TV 뉴스 앵커를 지낸 방송사의 보도국 차장)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 △공영방송 PD △야구선수(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의 한국인 야구선수) △대기업 회장 △여대생시절 전대협 대표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해 세간에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미국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공인이론’은 판례법상 발전된 것으로, 오보에 의한 명예훼손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언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 혹은 완화하기 위해 출발했다.
공인이론에선 △대체로 선거직이나 그 후보자, 정부의 중요정책 결정자, 검찰·경찰·군 고위 간부 등을 일컫는 ‘공직자’(Public Official)와 △유명인사로 불리는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대기업 총수 등 ‘전면적 공적 인물’(Pervasive Public Figure)이 있다.
그리고 △공직자나 유명인이 아니지만 어떠한 지위와 관련된 보도에 의해 혹은 특정한 공적 논쟁에 참여함으로써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인 ‘제한적인 공적 인물’ 혹은 ‘논쟁에 관련된 공적 인물’(Vortex Public Figure)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조차 공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