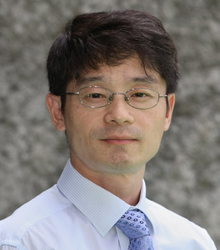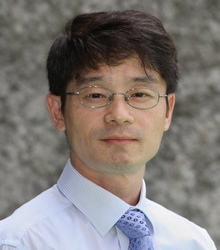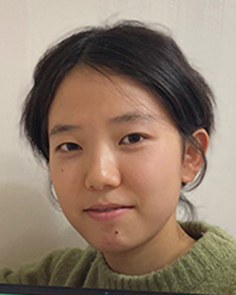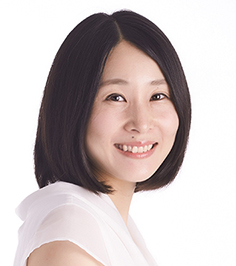[언론 다시보기] 전체기사
-
2021.10.05 22:36:48
-
2021.09.28 23:13:59
-
2021.09.14 22:50:59
-
2021.09.07 21:47:30
-
2021.08.24 23:03:46
-
2021.08.17 22:55:51
-
2021.08.10 21:35:28
-
2021.07.27 22:11:10
-
2021.07.20 23:33:45
-
2021.07.13 23: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