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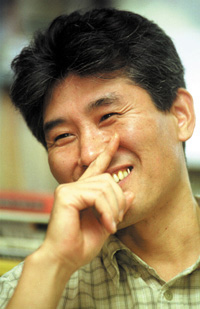 |
||
| ▲ 강준만 교수 | ||
대치동 뉴스만 그런 게 아니라 강남에 관한 거의 모든 기사들이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 언론 입장에선 뉴스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도하는 것뿐인데, 그게 오히려 사회적 차원에서 강남의 문제점을 키우는 역기능을 낳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언론은 선의의 고발성 기사로 강남의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는 걸 상세하게 보도해주지만, 그것은 전국에 걸쳐 파급효과를 갖는다. 한국에서 부동산 값은 상당 부분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리켜 ‘강남의 법칙’이라 부를 수 있겠다. ‘강남의 법칙’은 “언론이 뉴스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중요성이 큰 사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결과 원래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저널리즘의 딜레마”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딜레마는 저널리즘의 탄생 이래로 어느 나라에서건 나타나는 것이지만, 특히 한국에서 자주, 그것도 극심하게 나타난다. 한국 특유의 ‘1극 초강력중앙집중 체제’와 그 체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걸 넘어서 더욱 심한 ‘서울 1극 체제’를 자랑하는 언론 시스템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쏠림’ 현상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한국의 언론시스템에 대해 ‘거리두기’나 ‘낯설게 보기’를 시도하면 참으로 해괴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구가 5천만에 가까운 나라에서 그 나라의 여론 형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한 도시에 그것도 밀집된 특정 지역에 집중된 채 일하고 술 마시는 경우가 또 있을까?
사실 강남은 ‘섬’처럼 내버려두는 게, 아니 고립시켜주는 게 최상의 해법일 수 있다. 그 안에서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원이 넘든 1백억원이 넘든 그들끼리만 지지고 볶고 살게끔 외부세계와 차단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어느 사회건 상류층은 있기 마련이다. 상류층을 없애자는 운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 그들만의 세계를 갖게 해주는 게 그들을 위해서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물론 그건 이론일 뿐 가능한 해법은 아니다. 한국에선 계층 이동은 거의 끝나가고 있을망정 ‘학벌자본’의 위력은 여전해 강남은 늘 다른 모든 사람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구별짓기’와 동시에 ‘평등주의’가 강한 나라에선 강남은 서울대가 그런 위상을 누리는 것처럼 미주알 고주알 보도되어야만 하는 뉴스가치의 지존이다.
여기에 언론의 ‘서울 1극 체제’가 가세하니 강남은 늘 과잉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과잉 주목은 ‘강남 투쟁’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누가 ‘강남 죽이기’를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시비와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 강남과 강남 거주자를 분리해서 하는 말이라도 강남의 문제를 지적하면 그건 곧장 강남 거주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여겨지는 오해도 적잖이 가세하니, 그렇잖아도 복잡한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뒤엉키곤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언론이 ‘강남의 법칙’이 낳는 문제도 자주 기사화 해보는 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