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잡힌 국제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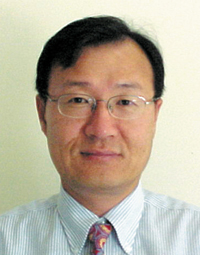 |
||
| ▲ 윤국한 재미언론인 | ||
5월27일자 워싱턴포스트는 1면에 3단 크기로 ‘한국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인터넷 게임 몰입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라면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더 많은 게임중독 사례를 보지만 사회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한국을 문제의 진원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앞서 5월 25일자 뉴욕타임스는 대전에서 탈북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두고 영업 중인 가라오케 주점을 소개하면서 탈북 여성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나쁜데도 한국인 고객들은 열광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화해의 기류 속에 북한식, 북한산 식품 등이 오염되지 않은 옛 멋과 맛을 간직한 것으로 여겨져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 주류 언론에 실리는 한반도 관련 기사는 북한 핵 등 안보 문제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근래 들어 소재 면에서 다소 다양해지는 느낌이 든다. 물론 아직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속,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등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대부분인데다 보도 건수도 많지 않다.
그렇지만 다양한 사회상에 대한 기획성 기사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위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상을 다루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보다는 영어공부 열풍 속에 일부 부모가 어린자식이 정확한 영어발음을 하도록 혀 아래 부분을 절개하는 수술까지 받게 한다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보도, 기러기 아빠의 사례를 자세히 전한 ‘워싱턴포스트’ 보도 등이 떠오른다. 위의 워싱턴포스트 기사 역시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온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마침 ‘미국과 한국 관계의 미래-힘의 불균형’ 이란 책의 저자인 미국 언론인 존 페퍼씨가 지난 23일 워싱턴의 한국대사관 홍보원에서 ‘미국 언론의 한반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페퍼씨는 이 강연에서 일반 미국인은 물론 언론인들도 상당수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한반도 보도에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택시위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보도에서 보듯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대결이나 위기상황 전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실린 그의 강연내용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어쩌면 이 것이 언론의 속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미국 언론이 한국과 관련해 반미시위, 노조의 과격한 행태 등 급격한 경제팽창과 민주화에 따른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페퍼씨의 지적은 맞다. 그리고 이는 분명 미국인들에게 한국이나 한국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그런데 나는 페퍼씨의 강연제목을 ‘한국 언론의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바꿔 달아도 그 내용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페퍼씨가 미 언론의 한반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원인으로 지적한 `자국 중심 시각’이나 ‘총체적이 아닌 위기에 치우쳐 바라보는 관점’ 등은 한국 언론의 미국 보도에서는 과연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페퍼씨의 강연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언론의 국제기사가 좀더 심층적이고 동시에 소재도 다양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