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설의 정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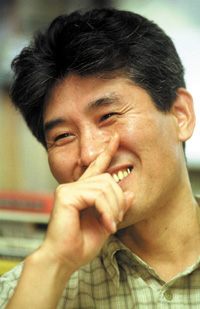 |
||
| ▲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그간 지배 엘리트 계급은 한통속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국민이 보는 앞에선 여야(與野)간 정언(政言)간 제법 싸우는 척 하지만 뒤론 각종 연고와 이해관계로 뭉친 동일 기득권 집단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노 정권 들어 독설이 주로 정부여당 인사들에 의해 양산돼 왔다는 건 그런 기존 질서를 깨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실제로 노 정권 지지자들은 그 점에 매료돼 자기 편 독설이 나올 때마다 뜨거운 지지 공세를 펴곤 한다.
그런데 그 점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건 ‘독설의 상례화’다. 고위 공직자라도 정말 의로운 분노를 견딜 수 없어 터뜨리는 독설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고 통쾌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물론 그런 독설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워낙 독설가 대열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 옥석 구분이 어렵다.
더욱 큰 의문은 독설로 손해 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언론의 비판은 순간이고 독설을 사랑하는 대통령 눈에 드는 건 영원하다. 물론 노 정권 끝나는 그날까지는 말이다. 독설에 대해 대통령이 눈살을 찌푸리는데도 독설을 하는 고위 공직자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순수한 독설이겠지만, 대통령이 독설을 흐뭇하게 생각하니 모든 독설은 일단 ‘충성’ 또는 ‘아첨’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보너스로 네티즌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뒤따르니 더욱 그렇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강고한 당파 구도 때문이다. 정치권의 당파 구도보다는 언론의 당파 구도가 더 큰 이유다. 어느 정도의 당파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폭 넓게 얻는 언론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독설의 향연’은 가능하지 않다. 언론은 독설의 정도·순수성·정당성 등을 검증해 합당한 비판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당파 구도에선 그건 무의미하다. 반대편 언론의 비판이 거셀수록 독설의 주인공은 자기 진영에선 뜨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당파성을 초월해 잘 생각해보자. 지금과 같은 과도한 당파 저널리즘은 스스로 언론의 영향력을 죽이는 자멸 코스가 아닌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독설의 향연은 언론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 아닌가. 아니 언론은 ‘독설 정치’의 동업자이기도 하다. 독설은 세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오는 건데, 언론 역시 세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독설이라면 일단 크게 보도해놓고 본다. 사실상 독설가들을 키워주는 셈이다.
당파성은 ‘신뢰’의 범주 내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그래야 언론이 힘을 쓴다. 사회를 향해서만 ‘신뢰의 위기’를 말하지 말고 언론 자신의 신뢰부터 회복하자. 그걸 올해의 최대 화두로 삼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국가와 민족 운운 할 것도 없다. 이건 언론의 영향력을 키워 이윤마저 더 늘릴 수 있는 남는 장사다. 언론사 내부의 쓴소리를 고무·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