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불란(一絲不亂)을 증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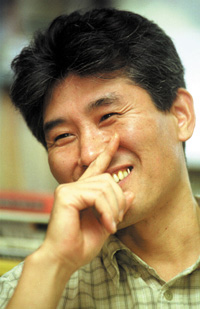 |
||
| ▲ 강준만 교수 | ||
‘황우석 파동’은 한국사회에 신뢰의 씨가 말랐음을 웅변해 주었다. 그 웅변은 언론매체들 사이의 대리전쟁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일이었다. 아직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도 각 신문은 어느 한 지점을 향해 돌진하는 일사불란(一絲不亂)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알 것 같다. 왜 사람들이 신문을 신뢰하지 않는지 말이다. 2004년 한국언론재단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신문을 선택한 응답자는 18.8%로 텔레비전(49.8%)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신문의 신뢰도는 90년 55.4%로 가장 높았지만 92년 46.2%, 98년 40.8%, 2000년 24.3% 등으로 계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신문 신뢰도 하락의 1차 원인은 ‘권력 다원화’ 현상이다. 과거엔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약자’로만 여겨졌던 신문이 국가권력이 약화 덕분에 국가권력과 공개적으로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약자 프리미엄’을 잃은 것이다.
2차 원인은 신문이 그렇게 달라진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점이다. 보수 신문이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비판할 때 동원하는 논리야말로 부메랑이 되어 신문들에게 날아간다. 신문은 싸우고 저항하는 법만 알았지, 국가경영이나 사회경영의 마인드가 부재했던 것이다.
진실을 말하자. 이제 신문은 정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었다. 당파적 노선을 걸으면서 비판하는 데엔 천재지만 갈등 조정 기능은 전무하다. 아니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걸 존재 근거로 삼고 있다. 여기서 비판의 타당성 여부와 정도는 사소한 문제다. 갈등 패러다임(틀)에 푹 빠져있다는 게 본질이다.
‘황우석 파동’이 ‘황우석-노성일 전면전’으로 비화한 지난 16일 우리의 동경 특파원들은 일본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적 기관이 신문이라고 전했다. 복수 응답에서 응답자의 64%가 신문을 지목했다. 가슴 아픈 일이다. ‘자유로운 비판 기능’과 그에 따른 ‘성역 없는 보도’라고 하는 점에선 한국 신문이 일본 신문보다는 한 수 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비판은 철철 흘러 넘치지만 신뢰는 바닥을 기는 신문으론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없다.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만약 한국 신문이 10%대가 아닌, 60%대의 신뢰를 누렸다면, 이번 ‘황우석 파동’의 양상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국민적 공황’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까지 가진 않았을 것이다.
신뢰를 당파성에 우선하는 가치로 복원시켜야 한다. 이제 신뢰는 신문 생존의 문제로까지 부상한 건 물론이고 만인의 동의할 수 있는 의미의 국익을 좌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신문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일사불란’부터 증오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 논쟁적 이슈에 대해 사설, 칼럼, 기사가 전부 따로 놀게끔 하자. 신문이 일정한 색깔과 방향성을 갖는 건 당연하며 바람직하다는 저널리즘의 대원칙부터 의심해보자. 그 대원칙은 애초부터 일사불란 문화가 없거나 약한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