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정말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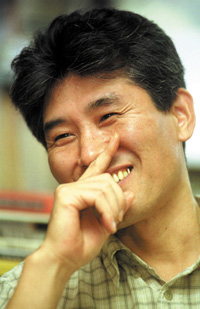 |
||
| ▲ 강준만 교수 |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일간지의 경우 37개 신청 신문사중 5개사, 그것도 부산·경남 지역 일간지를 3개나 선정함으로써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 위원은 “원래 20개사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그랬을 경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신문도 포함돼 발전기금의 정당성에 대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개혁특위도 “선정사가 소수여서 아쉽기는 하지만 지원법은 언론개혁을 담보로 한 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퍼주기나 지역안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그런 판단에 지지를 보냈다.
일부 공감한다. 과거 나는 몇몇 지역 대학의 행정대학원 특강을 다니면서 지방 기업인들의 지방언론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다는 걸 절감한 바 있다. “‘언론통폐합’이 필요한데 당신이 신방과 교수로서 그런 주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끔찍한 말까지 들어야 했다.
그러나 신방과 교수건 언론인이건 우리가 일반 시민들과 다르거니와 달라야 하는 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신문에 대한 ‘신뢰’가 뭔가? 그건 시장 및 자본력 크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언론개혁도 서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지방신문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조건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아니 그 이전에 ‘지방’을 하나로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어느 지역에선 최고 구독 신문이 중앙지가 아니라 그 지역 일간지다. 부산과 대구가 그런 경우다. 적어도 중앙지와 경쟁을 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 반면 어느 지역에선 모든 지방지를 다 합해도 전체 구독 신문의 10%가 되질 않는다. 90% 이상을 중앙지가 휩쓸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진 걸까? 신뢰? 개혁? 아니다. 경제력 때문이다. 신문이 먹고 살 광고가 없을 정도로 경제가 열악한 것이다.
인구는 계속 빠져 나가고 지방민들의 관심은 지역보다는 서울에 가 있다. 아무리 지방신문이 발버둥쳐도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런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은 지방대 신방과 교수일지라도 무슨 세미나만 했다 하면 지방 토호가 어떻다는 등 지방신문 두들겨 패기에 바쁜데, 발로 뛰는 연구를 해보기 바란다. 건설회사를 하는 지방 토호들의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방신문의 본질적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 역시 처음엔 서울의 시각으로 ‘지방신문 때리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지방대의 처지나 지방신문의 처지가 다를 바 없다는 걸 절감하고선 다시 보기 시작했다. 물론 지방대 교수나 지방신문 언론인들이 서울 교수나 언론인에 비해 못난 점은 많겠지만, 그들이 발악을 한다 해도 넘을 수 없는 구조적 벽이 있다는 걸 인정해줘야 한다.
지방신문은 지방자치의 성패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지역신문의 시장 점유율을 따져 차별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혁을 유도할 간접 지원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지방신문을 경멸만 하지 마시고 소통을 해주길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