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지식산업'으로 가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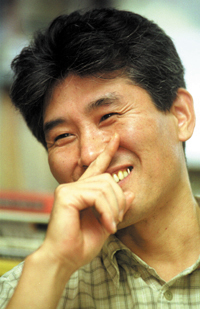 |
||
| ▲ 강준만 교수 | ||
신문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과거 신문 독자들은 신문 자체를 사랑했던 건가, 아니면 신문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사랑했던 건가? 두말할 필요 없이 후자다. 신문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매체환경의 급변으로 크게 달라져 다른 매체에서 더욱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면 신문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신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매체환경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문이 줄 수 있는 걸 특화하거나 차별화해 신문을 ‘리포지셔닝’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터넷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신문이 집중적으로 주되, 그걸 먹음직스럽게 포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놀랍게 생각해야 할 점은 신문의 정보·지식 생산방식과 패턴이 인터넷 이전과 이후에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고급 인력이 모여 있는 신문업계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다. 왜 그럴까? 신문은 이미 인터넷 이전부터 ‘스피드 경쟁’ 체제로 움직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떼거리로 몰려드는 기자들의 모습에서 신문산업의 어두운 그림자마저 보아야 한다는 건 곤혹스러운 일이다. ‘낙종에 대한 공포’는 모든 신문사, 모든 기자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저널리즘의 원칙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용이 있는 것인가? 상례적인 뉴스는 신문사간 협업체제로 경쟁을 죽여 비용을 낮추는 대신 새로운 유형의 지식생산으로 경쟁을 벌여 신문독자라고 하는 파이를 키우는 방식은 불가능한가?
정작 경쟁을 해야 할 건 카르텔 체제로 가고, 카르텔 체제 비슷하게 가야 할 건 경쟁을 하는 신문업계의 해묵은 관행에서 신문은 신문이라는 매체의 진부함보다는 그 종사자들의 진부함에 의해 쇠락의 길을 치닫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은 본격적인 지식산업으로 가야 한다. 고급 인력 데려다 소진시키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오히려 그들을 더 키우면서 사회 각계에 유용한 정보·지식을 생산해내는 공급기지로 변모해야 한다. 원래 그 일은 대학이 맡아야 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 대학들은 그런 일엔 별 관심이 없고 상아탑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하청에만 눈독을 들이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공백을 신문산업이 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문이 아예 싱크탱크의 노릇까지 맡아야 한다. 그게 바로 인터넷 시대에 신문이 살 길이다. 신문과 출판 사이에 존재하는 DMZ에 주목하면서 암묵지 개발에 앞장서고 교육기능의 일부까지 맡는 전방위적 지식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실질적인 정보·지식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를 맺어야지 광고에 목을 매는 식으론 장기적인 평안을 기대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