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원 이데일리 기자
기자 연차가 쌓일수록 책과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기껏해야 일과 관련된 실용서나 유행을 따라가려 어쩔 수 없이 읽는 서적이 대부분이었다. 작년 회사 독서모임에 가입한 뒤 유령회원처럼 지내던 올봄 내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자고 제안한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다. 우주나 천문학은 생소한 분야인데다가, 700쪽의 두께는 눈길을 주기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상의 헛헛함을 채워보려는 발버둥이었는지 모르겠다.
코스모스를 단순한 과학서적이라고 생각한 건 내 착각이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 인간의 탄생과 근원에 대한 물음이 과학과 역사, 철학 등과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책이었다. 출간한지 40년도 안 돼 고전 반열에 오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숫자와 과학, 천문분야의 전문지식이 나오는 부문도 있지만, 상상력과 흥미를 자극해 마치 옛이야기를 읽듯 쉽게 읽히는 게 장점이다. 사실 전문분야를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훨씬 힘든 일이다. 책 곳곳에서 우주과학은 어렵고 재미가 없다는 편견을 깨려는 저자의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특히 코스모스와 함께 지구와 우주, 생명의 탄생과 기원을 탐험하면서 일상에 파묻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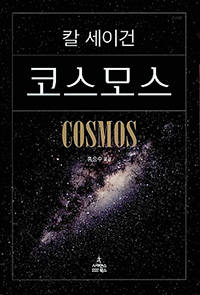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현대인은 늘 바쁘다. 기자도 마찬가지다. 앞만 보고 뛰면 바로 옆도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잦다. 나를 늘 중심에 놓다 보니 역설적으로 내 위치를 자주 까먹는다. 그래서 “이 길이 맞는걸까?” “나만 뒤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세이건은 “자신의 위상과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주변을 개선할 수 있는 필수 전제”라고 강조한다. 기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다. 나무에서 조금 떨어져야 숲이 보인다. 팍팍한 일상과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내가 어디쯤 있나 되돌아보는 시간을 준 이 책이 고맙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