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디지털 퍼스트’ 체감도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혁신’을 이야기하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정체기다. 다들 나름대로 시도는 해봤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으니까 헤매는 것 같다. 신문 기자들에게 현 상황에서 디지털 퍼스트가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일 것이다.”
종합일간지 6년차 기자의 말이다. 디지털 부서를 경험한 그는 다시 취재 부서에 배치되자마자 종이신문 제작에 맞춰 일하고 있다. 그는 “내일자 지면에 나갈 기사를 하루하루 소화하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 디지털과 멀어졌다”며 “매일 찍어야 하는 신문과 당장 눈에 보이는 트래픽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퍼스트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처 중심의 취재부서 신문기자들에게 디지털 퍼스트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다. 지난 2015년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국내 신문업계에서 디지털 혁신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어느샌가 뜨뜻미지근해졌다. 종합일간지들은 취재기자들이 디지털에 무게중심을 두고 기사를 쓰는 ‘디지털 퍼스트’보다는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유통하는 별도의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혁신’을 대신했다.

가장 먼저 본격적인 디지털 퍼스트를 선언한 중앙일보의 경우도 아직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 2015년부터 디지털 드라이브를 걸어온 중앙은 지난해 3월 말 디지털 전환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라 취재기자들은 디지털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신문 제작은 신설된 직책인 라이팅 에디터가 전담하도록 했다.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며 라이팅 에디터제를 폐지하는 등 현재도 실험을 거듭하는 중이다.
중앙일보 A 기자는 “처음보다는 디지털 마인드가 자리 잡은 것 같다. 반발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디지털 전환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편집국은 지면제작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짧은 시간에 변화하기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B 기자도 “디지털로 가면서 지면은 포기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 유료부수 발표에서 2년 연속 3위에 머무르자 편집국 분위기가 안 좋았다”며 “디지털에선 좋은 지표가 나와도 수익성이 없으니 아직까지 유료부수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이어 지난해 7월 경향신문도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했다. 지면 기사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매일 오전 열리던 부장회의를 폐지하고 취재기자가 디지털 기사만 출고하도록 했다. 또 중앙처럼 각 분야 에디터들이 디지털 기사를 재가공해 지면에 싣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과감한 시도 없이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사 생산에 대한 편집국 인식은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여전히 종이신문의 틀 안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C 기자는 “지난해 큰 변화를 시도하긴 했지만 결국 예전 제작 관행대로 돌아왔다”며 “오전에 보도자료를 온라인 처리하는 것 말고는 디지털에 특화된 기사를 쓴다던지, 디지털 퍼스트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아침 회의 때 4매, 7매, 10매로 결정되면 거기에 맞게 취재하고 지면에 낸다”고 설명했다.
그간 다른 종합일간지들도 디지털 혁신, 통합뉴스룸 구축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앞선 회사들처럼 눈에 띌 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통합뉴스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드는 TF를 운영했다. TF는 지난 7월 말 실행안을 작성했지만,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신문 노조는 지난달 공보위 소식지를 통해 “통합뉴스룸 실행 TF의 보고서가 편집국장에게 보고됐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보고서 가운데 어떤 안이 실행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TF 보고서를 두고 데스크 회의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일부 부장들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해 통합뉴스룸 실행 자체가 흐지부지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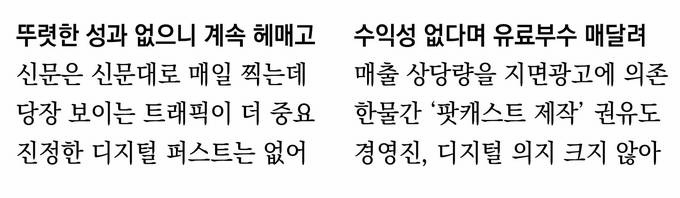
다른 종합일간지에서 혁신안 제작에 참여한 적 있는 D 기자는 “2014년 뉴욕타임스의 혁신 보고서가 공개되고 2015년 중앙일보가 디지털 전환을 선언했던 상황에서 다들 뭐라도 해보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부분 보고서를 위한 TF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저희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었는데 결국 실제 적용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아직 안정적인 디지털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데다 매출 상당수가 지면광고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영진이나 편집국 간부들의 디지털 퍼스트 실행 의지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C 기자는 “디지털로 가야하고 혁신해야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디지털 퍼스트를 한다고 해서 독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언론사들이 체감할 만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경영진·편집국 고참들 입장에선 디지털이 우리 먹거리가 된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먼저 디지털 전략을 제시한다 해도 일선 기자들과의 인식 차이가 크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종합일간지 E 기자는 “디지털 뉴스로 수익 내는 방법을 찾지 못한 회사가 새로운 탈출구로 기자들에게 유튜브와 한 철 지난 팟캐스트 제작을 권장하고 있다”며 “더구나 팟캐스트 1회 출연료로 1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다들 황당해했다. 가뜩이나 취재인력도 부족한데 누가 그 돈 받으려고 가욋일을 하려 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D 기자는 “사실 혁신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들이 디지털 전략을 주도하다 보니 계속 정체되고 있다. 종합일간지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라 다 같이 내리막길을 걷는 꼴”이라며 “‘디지털 혁신=트래픽’이라는 경영진의 인식 때문에 현장에서도 디지털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 과감한 인식 전환 없인 국내 신문사의 디지털 퍼스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