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남강변을 마주한 주택가의 한 골목길에 들어서니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 벽돌식 주택 두 채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뭉클’이란 이름의 게스트하우스를 문지기처럼 지키고 선 것은 책을 든 부엉이 모습의 나무조각품. 계단을 내려가 몇 걸음 더 옮기자 ‘책의 동굴’이 나타난다. 세월과 그에 더한 추억이 먼지와 함께 켜켜이 쌓인, 문을 열자마자 오직 헌책방에서만 맡을 수 있는 ‘책의 냄새’가 물씬 풍겨오는. 이곳은 책방지기이자, 작가이며, 오토바이 여행자이기도 한 조경국씨가 운영하는 ‘소소책방’이다.

▲“책만 파는 책방지기로 남고 싶다”는 조경국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소소책방’의 서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02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취재기자로, 편집기자로 약 6년 동안 일한 그는 지난 2010년, 10여 년간의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 진주에 자리를 잡았다. 책방 문을 연지는 햇수로 6년째다. 고등학교 시절 컴퓨터 잡지 과월호를 찾아 헌책방을 드나들 때부터 헌책방 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그다. 어엿한 책방 주인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작가’로 더 많이 불린다. 지금까지 써낸 책만 해도 10권 가까이 된다. 책방을 열기 전에는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용서를 주로 썼고, 요즘 글감은 책이나 책방이다. 지난달 출간된 첫 번째 소설집 <아폴로책방>은 ‘본격책방소설’을 표방했고, 한 해 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27일간 일본의 책방을 순례한 기록을 <오토바이로, 일본 책방>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시간이 날 땐 오토바이를 타고 훌쩍 여행을 떠나는 책방지기의 삶. 기자 시절 동료들이나 주변에선 마냥 부러워만 한다. 하지만 그 “속이 썩든 말든” 누가 알까. “물 위에 뜬 백조 같다고 할까요? 밑에선 열심히 발버둥을 쳐야 하거든요. 다른 책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헌책을 팔아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온갖 ‘알바’를 하며 지낸다. 목수 일을 하고, 사보나 관공서에서 내는 책자 등에 글을 쓰고 편집 일도 한다. “프리터족 같은 생활”이라고 그는 말했다. 당연히 책방을 자주 비울 수밖에 없다. 대신 책방 문을 24시간 열어둔다. 그가 없으면 단골손님이 봐주기도 하고, 아무도 없을 땐 컴퓨터 키보드 밑에 책값을 두고 가는 손님도 있다. 직원을 쓸 형편도 아니고, 온라인 판매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헌책방들 경우는 매출의 70~ 80%를 온라인으로 올려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온라인 판매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뒀어요. 중요한 게 돈 보다는 책, 책 보다는 사람이라는 원칙이 있었지요. 가능하면 좋은 책을 동네 분들이 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도서관 겸 헌책방의 개념이었으면 했죠. 그런데 이젠 원칙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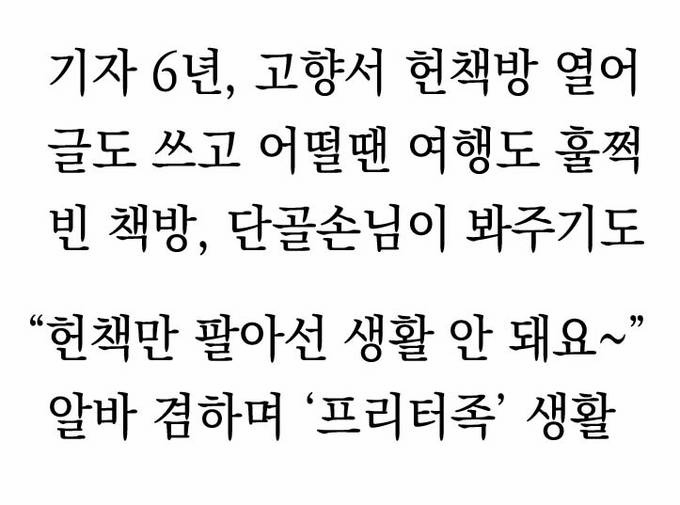
누가 책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질문부터 던진다. “건물주이신가요?” 5년 동안 책방을 3번이나 이사하고, 지금은 지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갤러리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그는 ‘자기 공간을 가져야 한다(=건물주여야 한다)’는 선배 책방지기들의 충고를 진리처럼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로처럼 책을 쌓아 두고 손님이 오든 말든 책방 맨 구석에 웅크려 있는 ‘게으른 책방지기’로 살고 싶은 꿈”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책방에서 커피나 맥주를 파는 것도 “안 맞아서” 못할 것 같단다. 결국 그는 책에서, 책방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그가 자꾸 오토바이를 타고 책방 여행을 떠나는 이유다.
책방을 열기 전 그는 세 가지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었다. 콧수염 기르기, 오토바이 면허증 따기, 책방 찾아 세계여행. 앞의 두 가지는 이미 이뤘지만, 세 번째는 미완으로 남았다. 원래 올해 오토바이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해 유라시아를 여행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러시아 월드컵 때문에 내년으로 미뤘다. 책방에선 돈이 솟아날 턱이 없으니,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알바를 마다하지 않고, 책도 여러 권 계약했다. 그는 “알바를 해보니 글 값과 사진 값이 너무 싸다”며 “기자라는 직업은 월급으로 유지가 되지만, 나와서 글을 써서 먹고 산다는 건, 한계가 너무 많다”고 푸념한다. 기자일 때나 지금이나 “글 쓰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육아 다음으로 힘들다”는 그는, 그러나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고 주저 없이 말한다. “좋은 작가가 나타나면 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거나,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거나, 돈벌이와 상관없이 원고를 쓰고 싶다거나, 하는 욕심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기자처럼 글과 관련된 일은 에너지를 빨리 소진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뒤도 옆도 돌아보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 고민하며 다음 이후의 삶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