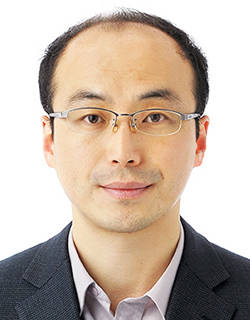
▲손제민 경향신문 워싱턴특파원
미국 대선 경선 투표가 시작되는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2~3주일 앞두고 샌더스가 두 지역에서 힐러리에게 우세를 보인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언론들은 그에게 좀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샌더스가 도입을 주장하는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에 재원을 어떻게 댈 것인가 등 그의 핵심공약을 심층 검증하는 기사가 비로소 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언론들은 그의 공약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다.
CNN 기사에 달린 한 댓글 반응처럼 언론들은 샌더스를 놓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지난 해 5월 샌더스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뉴욕타임스는 힐러리, 도널드 트럼프, 테드 크루즈 등 다른 후보들의 출마 기사를 1면에 장식하면서도 샌더스는 21면에 배치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샌더스 인물소개 기사는 “될 것 같지 않은 대통령 후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다. “과거의 히피, 강한 브루클린 사투리에 구깃구깃한 양복을 입고 헝클어진 백발을 날리며 ‘억만장자 계급’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며 공격하는 70대 사회주의자”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유세 현장마다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고, 250만건의 풀뿌리 소액기부에만 의존하는 샌더스의 모습은 8년 전 초선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 후보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오바마에게는 주목했던 주류언론들이 샌더스는 외면했다. 힐러리라는 강자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레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류언론의 오랜 무시가 전부 설명되지는 않는다.
전국적 방송에 나와 미국이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나라, 유일하게 유급 출산휴가나 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은 나라라며 통탄하는 이 노 정치인은 주류언론들에게 불편한 존재였던 것 같다. 미국이 덴마크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이 정치인의 주장은 “미국은 덴마크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다”라는 힐러리식의 자부심 섞인 서사 속에 뾰족 튀어나온 송곳처럼 느껴진다. 샌더스가 10월 첫 TV 토론회에서 미국사회는 덴마크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한 말은 주류언론에서 ‘덴마크 가서 살아라’라는 식으로 유통됐다.
주류언론의 입장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대목은 샌더스가 거대자본의 돈에 좌우되는 워싱턴 정치를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이다. 샌더스는 힐러리를 포함해 다른 모든 대선주자들이 기업들이 제한 없이 가져다주는 ‘슈퍼팩(Super PAC)’의 돈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돈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이상 ‘1%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얘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지만, 적어도 워싱턴 안에서는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진다. TV 토론회 중간중간 토론의 흐름을 끊는 대선 광고들 대부분이 이 돈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주류언론들 역시 샌더스의 존재가 달갑지 않다. 샌더스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6년 전 슈퍼팩을 가능하게 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의 승패는 아직 알 수 없다. 여전히 힐러리의 후보 지명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만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샌더스가 이기면 어쩌면 힐러리 캠프의 전망처럼 7월 전당대회 때까지 가는 승부가 될지도 모른다. 하나 이 시점에 분명한 패자가 있으니, 바로 미국 주류언론이다. 이들의 보도만 봐서는 미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