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9월), 한국경제(10월), 조선일보(11월) 등이 선보인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가 ‘출시 1주년’을 맞으면서, 이용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매경 e신문’은 유료 회원수가 4만여명(누적 기준)까지 증가했다. 매경e신문은 이달 들어 젊은 독자들을 겨냥해 ‘프리미엄 입시 상담’에 이어 대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덜어줄 ‘프리미엄 채용IR’, ‘여행 버킷리스트’, ‘세상만車’ 등을 새롭게 선보였다.
한국경제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한경 플러스’도 최근 일일 이용자 수가 올 초보다 20~30%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엄 조선’은 지난 7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5만448명으로, 작년 11월 출범 직후보다 3.4배 늘었다.
인터넷 서비스 특성상 출범 초기 급성장할 수 있지만, 1년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면 서비스의 연착륙에 ‘청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게 언론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출범 1주년을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편집국 기자들의 참여가 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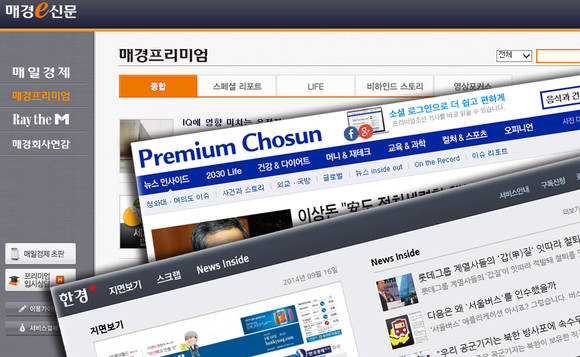
▲일부 신문사가 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를 선보인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용자수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관련부서 고위간부는 “처음엔 가욋일로 여겼던 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점차 늘고 있다”며 “뉴스 유료화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독자를 우선 확보하고 편집국 내 공감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프리미엄 콘텐츠’만을 가지고 수익모델로 만들기엔 여전히 힘에 부치다는 점이다. 국내 뉴스 판매 시장이 크지 않는데다, 과도한 통신료 부담도 뉴스 유료화를 발목 잡는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분기 13만4086원이던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지난해 1분기 15만7579원으로 늘어 5년 만에 18%가량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가구당 실질소득 증가율은 0.8%증가한데 그쳤다.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라 통신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다른 정보통신 이용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면 소비자들이 포털에서 볼 수 있는 ‘공짜 뉴스’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유료화로 가는 길은 험로가 될 수밖에 없다. 언론사들이 콘텐츠 판매 대상을 개인보다는 기업(B2B)에 목매는 원인 중 하나다.
뉴스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한 매경, 한경 역시 주된 서비스는 가판 PDF서비스이고, 프리미엄 콘텐츠는 부가적인 서비스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유료화를 선언한 조선 역시 올해 유료화로 전환하기보다는 프리미엄 회원 수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6만명 내외인데, 올해 1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을 넘겨야 사업모델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온라인 퍼스트’를 기치로 내건 대부분 신문사들은 콘텐츠 유료화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실제 중앙일보는 당초 연내 뉴스 유료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중앙 관계자는 “중앙 미디어그룹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를 유료화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내 유료화는 다소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 유료화가 정체기를 겪고 있는 신문사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란 기대감 자체가 애초부터 과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경제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타임스가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언론사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교육 등 비미디어사업군의 성공이 바탕이 됐다”며 “유료화가 우선되기 보다는 먼저 매체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